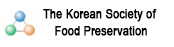1. 서론
식량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생산자들은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농작물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농약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농약의 사용으로 인한 잔류물은 식품을 통해 소비자에게 노출되어 위험이 될 수 있다(Woo 등, 2010). 2021년 해외 위해식품정보에 따르면, 원인요소별 발생 건수는 잔류농약, 미생물, 알레르기 성분 미표시, 안전관리 미흡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 중 화학적 원인요소인 잔류농약이 총 4,147건(28.3%)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NFSI, 2022). 식품 유형별로는 과일류에서 556건, 채소류에서 513건, 빙과류에서 532건의 잔류농약이 검출되어 다양한 식품군에 대해 지속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함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은 농산물 및 관련 가공식품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잔류농약에 대한 잔류허용기준(maximum residue limit, MRL)을 설정하고 있다(Lee와 Woo, 2010; Lee 등, 2005).
농약의 MRL은 식품 중 잔류할 수 있는 최대 농도를 법으로 정한 것으로, 우수농산물관리제도(good agricultural practice, GAP)에 따라 농약을 살포하여 수확한 농산물 중 농약의 잔류량과 1일 섭취허용량(acceptable daily intake, ADI), 식품섭취량(food consumption) 및 국민 평균체중 등을 고려하여 설정한다(MFDS, 2017; Park 등, 2005). 우리나라는 농촌진흥청(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RDA)에서 잔류시험 자료를 검토하여 농약을 등록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MFDS)에서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인체에 대한 위해평가 후 MRL을 설정하고 있다(MFDS, 2017; MFDS, 2024b; RDA, 2024a).
식품 중 잔류농약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각국에서 잔류농약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Kim 등, 2010; Kim 등, 2014; Lee와 Woo, 2010). 이는 자국에서 생산한 식품과 수입식품에 대해 MRL에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식품 중 농약의 잔류량이 MRL 내에 있을 경우 유통 및 통관시키며 MRL을 초과하는 경우는 금지 조치가 내려지고 있다.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국내식품과 수입식품 중 MRL 적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잔류된 농약을 분석하고 있으며, 이때 검체의 사용부위는 MRL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식품의 분석 부위에 따라 MRL이 결정되고 식품 중 MRL 준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잔류농약 검사를 시행하기 때문에 잔류농약 분석법과 그에 따른 검체 사용부위가 매우 중요하다(Cho 등, 2012; Im, 2007). 잔류농약 검사를 위한 검체는 검사대상 식품 중 대표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규정에 따라 식품의 부위를 취해야 한다. 대부분 국가에서는 이를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Codex) 규정을 기본으로 하여 식품의 수출 및 수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활용하고 있다(Codex, 2013). 반면, 잔류농약 분석을 위한 식품의 사용부위가 농약 등록 및 MRL 설정에 사용되는 시험법과 일치해야 하나, 우리나라의 경우 MFDS와 RDA 두 기관에서 이원화되어 관리되고 있다(MFDS, 2024a; RDA, 2024b). 이로 인해 Codex 및 다른 국가들의 규정과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도록 검체 사용부위와 처리방법의 표준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견과종실류(tree nuts and seeds), 과일류(fruits) 및 향식식물(herbs and spices)에 대한 Codex 및 주요 교역국인 미국, 유럽, 호주 및 일본의 잔류농약 분석을 위한 검체 사용부위 규정을 조사하여 국내 규정과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각국의 식품 분류체계와 명칭의 차이를 먼저 비교한 후에 검체 사용부위 및 처리방법을 비교 ․ 분석하였다. 이와 더불어 국내 규정과 상이한 부분에 대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향을 탐색하여 국제 기준과의 조화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자 한다.
2. 각국의 식품 분류 비교
각국의 잔류농약 검사를 위한 검체 사용부위 및 처리방법은 식품 그룹별로 규정하거나 별도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별로 그룹 명칭 또는 분류체계가 다르므로 각국의 검체 사용부위를 비교하기에 앞서 식품 분류를 먼저 비교 ․ 분석할 필요가 있다. Codex 및 세계 각국에서는 대부분 과일류(fruits), 채소류(vegetables), 초본류(grasses), 견과종실류(nuts and seeds), 허브 및 향신료(herbs and spices) 등으로 대분류하고 있다(APVMA, 2024; Codex, 1993; Codex, 2017; Codex, 2018; EU, 2019; MHLW, 2024b; NARA, 2024). 한국의 식품 분류는 MFDS의 식품공전에서 식물성 원료를 곡류(cereal grains), 서류(potatoes), 두류(pulses), 견과종실류(tree nuts and seeds), 과일류, 채소류, 버섯류(mushrooms), 향신식물(herbs and spices), 차(tea leaves), 호프(hops), 조류(algae) 및 기타 식물류(other plants)로 분류하고 있다(MFDS, 2023). 이중 견과종실류, 과일류 및 향신식물에 대한 식품 분류를 Table 1에 나타내었다. 견과종실류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국가가 견과류(tree nuts), 유지종실류(oilseeds), 및 음료 및 감미 종실류(seed for beverages and sweets)로 소분류하고 있다. Codex는 이 세 그룹과 ‘tree saps’을 포함하여 ‘nuts, seeds, and saps’라는 대분류로 분류하고 있다(APVMA, 2024; Codex, 2018; EU, 2019; MFDS, 2023; MHLW, 2024b; NARA, 2024). 견과류의 경우, Codex, 미국 및 호주에서는 ‘tree nuts’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고 유럽도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나 과일류로 분류하고 있다(APVMA, 2024; Codex, 2018; NARA, 2024). 한국은 MFDS에서 땅콩을 견과류와 함께 땅콩 또는 견과류(peanut or tree nuts)로 분류하고 일본은 ‘tree nuts’ 그룹이 없다(MFDS, 2023; MHLW, 2024b). 유지종실류는 모든 국가에서 분류하고 있는데 이 중 Codex는 ‘oilseeds and oilfruits’라는 명칭을 사용하며, 유럽은 ‘oil seeds and oilfruits‘ 대분류 안에 ‘oilseeds’와 ‘oilfruits’를 분류하고 있다(Codex, 2018; EU, 2019). 음료 및 감미 종실류에는 카카오 원두, 커피원두 등이 포함되어 있고 Codex, 호주 및 한국에서 ‘seed for beverages and sweets’ 명칭을 사용하며 일본에서는 ‘seed for beverages’라 사용하고 있다(APVMA, 2024; Codex, 2018; MFDS, 2023). 유럽은 ‘seed for beverages and sweets’라는 그룹을 두지 않고 ‘coffee beans’, ‘cocoa(fermented beans)’, ‘carobs(st John’s bread)’ 그룹으로 각각 분류하고 있으며, 이 그룹들은 ‘tea’, ‘herbal infusions’ 그룹들과 함께 ‘teas, coffee, herbal Infusions and cocoa’의 대분류에 속해있다(EU, 2019).
과일류의 경우, 소분류 중 감귤류(citrus fruits), 인과류(pome fruits), 핵과류(stone fruits)는 모든 국가에서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여 분류하고 있다(APVMA, 2024; Codex, 1993; EU, 2019; MFDS, 2023; MHLW, 2024b; NARA, 2024). 장과류는 ‘berries and other small fruits’라는 명칭을 Codex, 유럽, 호주 및 한국에서 사용하며, 미국과 일본은 ‘berries’라는 명칭을 사용한다(APVMA, 2024; Codex, 1993; EU, 2019; MFDS, 2023; MHLW, 2024b; NARA, 2024). 특히, 일본은 포도를 ‘berries’에 속하지 않고 별도의 그룹으로 분류하고 있다. 열대과일류(assorted tropical and sub-tropical fruits)의 경우 Codex, 미국 및 호주에서는 식용 껍질(edible peel)과 비식용 껍질(inedible peel)로 나누어서 분류하고 있으나 일본과 한국은 구분하지 않고 있다(APVMA, 2024; Codex, 1993; MFDS, 2023; MHLW, 2024b; NARA, 2024). 또한 유럽은 ‘miscellaneous fruit’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열대과일을 분류하고 있다(EU, 2019).
향신식물의 경우, 유럽과 한국을 제외한 국가들은 허브류(herbs)와 향신료(spices)를 별도의 그룹으로 분류하고 있다(APVMA, 2024; Codex, 2018; MHLW, 2024b; NARA, 2024). 유럽에서는 ‘herbs’ 대신 ‘herbal infusions’를 사용하며, 이는 ‘teas, coffee, herbal Infusions and cocoa’ 대분류에 속한다(EU, 2019). 반면, ‘spices’는 별도의 대분류로 규정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허브류, 향신열매(spice, fruit of berry), 향신씨(spice, seeds), 향신뿌리(spice, root or rhizome) 및 기타 향신식물(spice, other)로 세분화하여 분류하고 있다(MFDS, 2023).
결론적으로 한국의 견과종실류, 과일류 및 향신식물의 식품 분류는 대부분의 국가들과 유사하지만, 한국은 땅콩을 견과류에 포함시키고, 열대과일류를 식용 및 비식용 껍질로 구분하지 않으며, 향신류를 네 가지 그룹으로 세분화하는 점에서 차이를 보였다.
Im(2013)은 Codex, 미국 및 한국의 식품 분류를 비교 ․ 분석하였으며, 2010년 개정 이후 한국의 분류가 Codex와 유사해졌으나 여전히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많아 Codex의 식품 분류체계와 조화를 이루는 것이 한국의 소면적 농산물에 대한 그룹 MRL 설정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하였다. Lee(2023)는 식물성 식품에 대한 Codex 식품 분류의 구조와 원칙을 소개하였고 Lee(2019)는 Codex의 곡류, 견과종실류, 허브 및 향신료에 대한 세부적인 식품 분류를 소개하고 한국의 식품 분류체계와 차이점을 비교하였다. 이 연구는 위해물질의 국내 기준 설정 시 Codex 기준과의 조화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Codex 식품 분류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함을 강조하며, Codex 식품 분류를 사용할 경우 국내 체계와의 차이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전 연구와 달리 검체 사용부위를 집중적으로 비교하기 위해 국가별 분류체계를 검토하였으며, 세부 식품별 품목보다는 그룹 분류에만 초점을 맞추었으나 Codex, 미국, 유럽, 호주 및 일본의 식품 분류를 포괄적으로 비교함으로써 잔류농약 분석과 MRL 설정에 대한 국제적 조화를 이루는 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3. 잔류농약 분석을 위한 검체 사용부위 비교
세계 각국에서는 식품이 유통되는 형태에 따라서 농약의 MRL을 설정하고 있다. 식품 중 MRL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하여 각국에서는 잔류농약 분석을 위한 검체의 사용부위를 정하고 있다. 세계 각국의 잔류농약 분석을 위한 검체 사용부위 규정은 Codex의 경우는 가이드라인으로 규정(Codex, 2013; Codex, 2023), 미국은 매뉴얼로 농산물 그룹별로 수록되어 있으며(FDA, 1999), 유럽은 European Economic Community (EEC, 1990.11.27.)의 부속서에 규정되어 있다(EU, 1990). 일본의 경우 후생노동성의 식품 ․ 첨가물 등의 규격기준에 규정하고 있으며(MHLW, 2024a), 호주는 농약 MRLs 에 규정되어 있다(APVMA, 2022). 한국의 경우 MFDS는 식품공전 시험법에 각 품목별 검체 사용부위에 규정되어 있으며, RDA에서는 농약 및 원제의 등록 기준에 작물별 시료 채취 부위와 분석 부위를 나타내고 있다(MFDS, 2024a; RDA, 2024b).
한국의 농약 기준 적용을 위한 검체 사용부위는 MFDS에서 곡류, 서류, 두류, 채소류, 과일류, 버섯류, 종실류, 견과류, 호프, 건포도, 건조채소류, 차 및 인삼으로 분류되며, RDA에서는 곡물류, 서류, 콩류, 유지종실류, 근채류, 엽채류, 과채류, 과실류, 버섯류, 차, 인삼 및 약용작물로 구분된다. 각 기관은 그룹별로 일부 농산물 품목에 대해서만 검체 사용부위를 매우 제한적으로 제시하고 있다(MFDS, 2024a; RDA, 2024b). 이러한 규정은 개별 농산물에 대한 사용부위만 기술되어 있어 식품 분류에 있는 모든 농산물에 대한 적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한국의 잔류농약 분석을 위한 견과종실류, 과일류 및 향신식물 검체 사용부위를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도록 표준화하기 위하여 세계 각국의 방법을 비교 ․ 분석하였다.
세계 각국의 잔류농약 시험법 중 견과종실류, 과일류 및 향신식물의 검체 사용부위를 Table 2, 3 및 4에 나타내었다. Codex, 미국, 유럽 및 호주는 검체 사용부위를 농산물 그룹별로 정하고 있고 일부 품목은 식품별로 정하고 있지만, 한국과 일본의 경우 농산물별로만 정하고 있어 다른 국가들과 사용부위 규정의 일부 차이를 보였다(APVMA, 2022; Codex, 2013; Codex, 2023; EU, 1990; FDA, 1999; MFDS, 2024a; MHLW, 2024a; RDA, 2024b). 따라서 세계 각국과 국내의 규정을 비교하기 쉽도록 한국의 식품 분류 그룹 명칭에 각국에 해당하는 그룹을 배치하여 작성하였고, 한국 및 일본의 개별 품목들도 해당 그룹에 맞추어 정리하였다. 그 후 비교 ․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에서의 검체 사용부위 및 처리방법을 통일하였으며, 이를 Table 5에 요약하여 나타내었다.
견과종실류 중 땅콩 또는 견과류에 대한 검체 사용부위는 세계 각국에서 일관되게 겉껍질(hulls) 또는 껍질(shells)를 제거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Table 2; APVMA, 2022; Codex, 2013; Codex, 2023; EU, 1990; FDA, 1999; MHLW, 2024a). 한국의 경우, MFDS에서는 땅콩의 깍지와 견과류의 외과피를 제거하도록 되어 있으며, RDA에서는 땅콩에 대하여 꼬투리를 제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MFDS, 2024a; RDA, 2024b). 다른 국가와 문구 표현은 다르나 의미는 동일하므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표현으로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Codex와 호주는 밤(chestnut)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견과류에 포함시켜 현행 방법을 유지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된다(APVMA, 2022; Codex, 2013). 따라서 땅콩의 깍지와 견과류의 외과피를 모두 겉껍질로 수정하여, ‘겉껍질을 제거한 전체’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Table 5).
유지종실류에 대해서는 Codex, 유럽과 호주가 공통된 규정을 두고 있지만, 다른 국가들은 개별 식품에 대해서만 사용부위를 명시하고 있다(APVMA, 2022; Codex, 2013; Codex, 2023; EU, 1990; FDA, 1999; MFDS, 2024a; MHLW, 2024a; RDA, 2024b). Codex는 기존에 ‘oilseed’는 전체로, 올리브(olive)는 줄기와 씨를 제거한 것으로 사용부위를 규정하였으나, 54차 Codex Committee on Pesticide Residues(CCPR)에서 ‘oilseeds’는 껍질이 포함된 씨 또는 종자로 사용하며, ‘oilfruits’는 전체를 사용하도록 개정되었다(Codex, 2013; Codex, 2023). 유럽은 씨나 종자를 사용하되 가능한 경우 껍질을 제거하고, 호주는 껍질을 제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APVMA, 2022; EU, 1990). 일본과 한국의 MFDS 및 RDA에서는 참깨와 같은 개별 품목들에 대해 전체 종자를 사용하고 있으며, MFDS에서 해바라기씨(sunflower seed)와 면실(cotton seed)에 대해서는 외피를 제거하도록 명시하고 있다(MFDS, 2024a; MHLW, 2024a). 올리브의 경우, 미국과 호주는 줄기(stem)와 씨(stone)를 제거하는 반면, 유럽은 줄기(stem)를 제거하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APVMA, 2022; EU, 1990; FDA, 1999). 이는 올리브가 과일류로 분류되는 경우에 씨까지 제거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국내 유지종실류의 검체 사용부위는 유럽의 세밀한 표현 방법을 참고하여 ‘씨(종자) 전체 또는 껍질(shell 또는 husk)을 제거 가능한 경우 제거한 알맹이(kernal)’로, 올리브는 유지를 추출할 수 있는 열매이므로 최근 개정된 Codex 규정을 참고하여 ‘열매 전체’로 표준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음료 및 감미 종실류에 대한 검체 사용부위는 Codex, 호주, 일본 및 한국의 MFDS에서 조사되었다. 대부분의 경우 시료 전체가 사용되지만, 일본은 카카오 원두(cacao bean)에 대해 농약 성분에 따라 외피를 제거하거나 제거하지 않는 방식으로 구분되고 있다(APVMA, 2022; Codex, 2013; Codex, 2023; MHLW, 2024a). 반면, 한국의 MFDS는 카카오 원두에 대해서만 내피를 제거한 종자로 사용부위가 명시되어 있다(MFDS, 2024a). 따라서 다른 국가들의 방법을 혼합하여 카카오 원두뿐만 아니라 그 외 품목에도 적용 가능하도록 그룹 전체에 대한 일관된 규정이 필요해 보인다. 이에 따라, 음료 및 감미 종실류에 대해 국제적으로 통일된 방법으로 ‘전체(열매의 다른 부분을 포함하지 않는 종자)’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과일류에 대한 검체 사용부위 및 처리방법을 조사한 결과, 인과류의 경우 세계 각국은 일반적으로 줄기(stem)나 꼭지(cap)를 제거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감(persimmon)과 비파(loquat)에 대한 방법은 별도로 정하고 있다(Table 3; APVMA, 2022; Codex, 2013; EU, 1990; FDA, 1999; MFDS, 2024a; MHLW, 2024a; RDA, 2024b). 한국에서 감의 경우 MFDS에서는 받침(calyx)과 씨를 제거하나 RDA에서는 꼭지만 제거하도록 되어있다(MFDS, 2024a; RDA, 2024b). 일본에서도 감은 줄기와 씨를 제거하고 있으며, 비파는 줄기, 껍질 및 씨를 제거하도록 명시되어 있다(MHLW, 2024a). 감과 비파는 사과와 농약이 잔류되는 양상이 유사하여 인과류로 분류되고 있다(Im, 2012). 다른 인과류와의 씨의 형태적 차이를 고려할 때, 가식 부위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이므로 별도의 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감의 경우, 씨가 과육 내에 분포하고 있어 분리하는 과정에서 오염 또는 농약 손실이 우려되므로, Codex 및 RDA 방법에 따라 씨를 제거하지 않고 과일 전체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인과류의 사용부위는 Codex, 미국, 유럽 및 호주의 방법을 참고하여 ‘줄기를 제거한 과일 전체’로 정하고, 비파는 ‘줄기, 껍질과 씨를 제거한 과일 전체’로 통일화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감귤류의 사용부위는 세계 각국 모두 전체로 정하고 있고, 일본은 여름 감귤(Citrus natsudaidai)에 대해 별도 규정을 두고 있다(APVMA, 2022; Codex, 2013; EU, 1990; FDA, 1999; MFDS, 2024a; MHLW, 2024a; RDA, 2024b). 따라서 다른 국가들의 규정과 국내 규정이 일치하였다. 핵과류의 경우, Codex, 미국 및 호주에서는 줄기와 씨를 제거하고 유럽은 줄기를 제거한 전체로 정하고 있다(APVMA, 2022; Codex, 2013; EU, 1990; FDA, 1999). 일본의 경우 Codex, 미국 및 호주와 동일하나 복숭아에 대해서는 껍질과 씨를 제거하여 분석하도록 정하고 있다(MHLW, 2024a). 한국에서는 MFDS와 RDA 모두 핵과류의 개별 품목에 대하여 꼭지와 씨를 제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MFDS, 2024a; RDA, 2024b). 꼭지는 줄기의 일부로 간주되기 때문에 한국의 핵과류에 대하여 Codex, 미국, 유럽, 호주의 사용부위인 ‘줄기와 씨를 제거한 과일 전체’로 표준화하는 것이 국제적으로 일관성을 갖추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장과류의 경우 Codex, 미국, 유럽 및 호주에서는 일반적으로 꼭지와 줄기를 제거한 전체 과일로 규정되어 있으나, 커런트(currant)는 줄기를 포함한 전체를 사용한다(APVMA, 2022; Codex, 2013; EU, 1990; FDA, 1999). 일본에서는 라즈베리(raspberry)를 전체로 처리하며, 포도는 줄기를 제거하고 그 외는 꼭지와 줄기를 제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MHLW, 2024a). 한국에서는 딸기에 대해 MFDS는 받침(calyx)을 제거한 것으로, RDA에서는 꼭지를 제거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포도의 경우, MFDS와 RDA 모두 꼭지와 줄기를 제거하여 사용한다(MFDS, 2024a; RDA, 2024b). 한국의 커런트는 RDA에서 등록 시험에 줄기를 제거한 후 잔류량을 분석하고 있으므로 다른 장과류와 동일하게 분석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장과류에 대하여 과일 형태적으로 받침이 있는 과일은 이를 제거하고, 받침이 없는 경우는 줄기를 제거하는 것으로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열대과일류의 경우, Codex와 호주는 열대과일류가 식용 껍질과 비식용 껍질로 분류되어 있으며, 개별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품목은 과일 전체를 사용한다(APVMA, 2022; Codex, 2013; Codex, 2023). 대추야자(date palm), 파인애플(pineapple), 아보카도(avocado), 망고(mango), 바나나(banana) 및 딱딱한 씨가 있는 유사 과일들은 별도로 사용부위가 규정되어 있다. 미국은 Codex에서 나열한 개별 품목과 동일하며, 그룹에 대한 규정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FDA, 1999). 유럽은 아보카도, 바나나, 대추야자, 무화과(fig), 키위(kiwifruit), 금귤(kumquat), 리치(litch), 망고, 올리브, 패션 푸르트(passion fruit), 파인애플, 석류(pomegranate)를 ‘miscellaneous fruit’로 분류하고, 이 중 파인애플은 크라운과 줄기를 제거하며 나머지는 줄기를 제거한다(EU, 1990). 또한 코코넛(coconut)은 견과류로 분류되어 있으며, 껍질을 제거한 것을 사용한다. 일본은 패션 푸르트, 파파야(papaya), 대추야자, 파인애플, 아보카도, 망고, 바나나, 구아바(guava) 및 키위에 대해 사용부위를 명시하고 있다(MHLW, 2024a). 한국의 경우 MFDS는 파파야, 파인애플, 아보카도, 망고, 바나나 및 키위에 대한 규정이 있으며, RDA에는 이들 과일류에 대한 규정이 없다(MFDS, 2024a). 국내 규정은 대부분 다른 국가와 일치하나 Codex 및 다른 국가에서 명시하는 개별 품목의 수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여 과일의 특성에 따라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열대과일류의 공통적인 검체 사용부위는 ‘줄기를 제거한 과일 전체’로 정하고, 대추야자는 ‘줄기와 씨를 제거한 전체’, 구아바, 바나나 및 키위는 ‘꼭지를 제거한 전체’, 파인애플은 ‘왕관(crown)을 제거한 전체’, 아보카도, 망고 및 두리안(durian)은 ‘씨를 제거한 전체’, 코코넛은 ‘껍질을 제거한 과일 전체’로 통일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과일류에 관한 국내 연구를 살펴보면, 검체 처리는 식품공전에 규정되어 있는 검체 사용부위에 따라 수행되며 잔류농약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다(Cho 등, 2012; Kim 등, 2023; Kwak 등, 2024). 특히, Kim 등(2023)은 과일의 검체를 껍질을 포함한 전체, 껍질 및 과육으로 구분하여 분석했을 때 전체 과일에서의 농약 검출률은 68.8%, 껍질에서는 95.5%, 과육에서는 36.6%로 나타나, 과육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을수록 농약 검출률이 떨어지고 분석 부위에 따라 농약 검출률에 큰 차이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이는 농약이 대부분 껍질에 잔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별로 검체 사용부위가 다르면 검출 결과가 달라져 국제 무역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국제적인 표준화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향신식물의 규정을 Table 4에 나타내었다. 허브류는 Codex에서 전체를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생 허브(fresh herb)와 건조 허브(dried herb)가 모두 해당된다(Codex, 2013). 미국은 허브류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검체 사용부위 규정 중 ‘Miscellaneous raw fruits and vegetables not previously included’에 대한 내용을 참고하였으며, 부패하거나 시든 잎, 꽃잎, 줄기 등을 제거한 것(흙이 묻어 있는 경우, 흐르는 물로 제거)을 사용한다(FDA, 1999). 유럽에서는 fresh herb를 엽채류와 함께 분류하며, 썩은 겉잎, 뿌리 및 흙을 제거한 전체를 사용한다(EU, 1990). 호주는 fresh herb와 dried herb로 구분하나 검체 사용 부위는 모두 시료 전체를 사용하며, 일본은 가식 부위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APVMA, 2022; MHLW, 2024a). 우리나라는 허브류에 대한 명확한 검체 처리 규정이 없다.
2020년 국내 유통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허브류 114건 중 36건(31.6% 검출률)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되었으며, 이 중 7건은 MRL을 초과하였다(Bae 등, 2021). 허브류는 시중에 생것과 건조된 형태로 유통되며, 수거된 시료의 40.4%가 수입농산물이었다. 따라서 잔류농약의 안전관리를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검체 사용부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 각국의 허브류에 대한 사용부위를 종합하면, 생것과 건조된 허브 모두 시료 전체를 분석하나 생 허브의 경우, 흙, 시든 잎 및 뿌리를 제거하는 등의 세부적인 처리 방법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이러한 국제 기준에 맞추어 생과 건조 허브를 구분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유럽 및 다른 국가의 규정을 참고하여 허브류(생)는 ‘부패하거나 시든 잎, 꽃잎, 줄기, 뿌리 등을 제거한 전체. 단, 흙이 묻어 있는 경우 가볍게 털어 제거한 것’으로, 허브류(건조)는 ‘전체’를 사용하는 것으로 사용부위를 통일화할 필요가 있다.
향신열매, 향신씨, 향신뿌리 및 기타 향신식물의 경우, 각각의 검체 사용부위를 특정하여 정한 국가는 없었으며, Codex와 호주는 ‘spices’를 전체로 규정하고 있다. 일본은 가식부위만을 사용하며, 미국과 유럽은 ‘spices’에 대한 규정이 없었다. 한국은 향신열매를 MFDS의 기타과일류 규정인 가식부위로 적용할 수 있으며, 향신뿌리는 RDA의 약용작물(뿌리 이용) 규정만 있기 때문에 다른 국가의 자료를 참고하여 통일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향신열매, 향신씨, 향신뿌리 및 기타 향신식물의 각각의 규정을 호주의 ‘spices’에 대한 규정을 참고하여 ‘특정하지 않는 한 열매, 씨, 뿌리 및 식물 전체’로 표준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Park 등(2022)은 Codex, OECD, 유럽, 한국의 MFDS 및 RDA에서 규정하고 있는 식품 분류와 잔류농약 분석을 위한 검체 사용부위을 비교하고 개선 논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규정을 수정 ․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개선될 필요가 있는 견과종실류, 과일류 및 향식식물에 대한 검체 사용부위를 집중적으로 비교한 후 국제적으로 표준화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였다. 이는 국제 기준과의 조화를 이루어 국제 무역이 원활할 수 있도록 활용될 수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국가의 기준과 조화를 이루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4. 요약
식품 중 잔류농약의 안전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각국은 농약의 MRL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잔류농약 검사 시 검체의 사용부위의 선택이 중요하다. 그러나 국내뿐만 아니라 국가별로 규정이 다를 경우 국제 무역에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 Codex, 미국, 유럽, 호주 및 일본의 견과종실류, 과일류 및 향신식물에 대한 식품 분류와 잔류농약 시험법 중 검체 사용부위를 비교 ․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검체 처리방법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식품 분류의 경우, 대부분 국가가 유사하였으나 일부 국가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잔류농약 시험법 중 검체 사용부위를 비교한 결과, 의미는 동일하지만 표현 방식이 다른 경우가 있었으며, 감, 비파 등 특정 식품에 대한 규정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국가들의 방법을 조합하여 땅콩 또는 견과류, 유지종실류 등 13개 그룹에 적용할 수 있는 검체 사용부위를 통일하였으며, 올리브, 대추야자 등 11개 품목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규정을 마련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는 국제 기준과의 조화를 통하여 잔류농약 분석법의 신뢰성을 높이고 식품의 원활한 국제 무역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