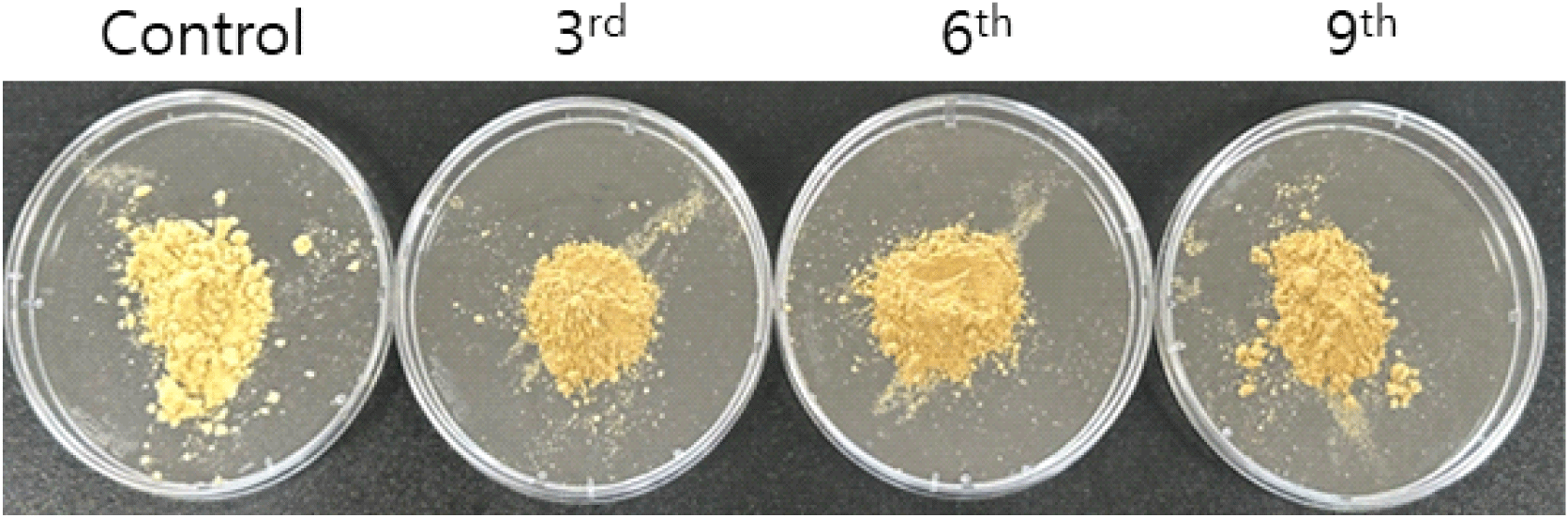1. 서론
인간은 다양한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수천 년 동안 허브를 사용해 왔다(Ozkur 등, 2022). 생강은 약 5,000년 전부터 요리와 약리학에 사용되었으며, 아시아 국가 원주민에 의해 다양한 질병 치료를 위해 요리 및 약초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섭취되어 왔다(Komiljonova, 2024). 생강이 건강한 노화를 촉진하고 질병률을 줄이며 건강한 수명을 연장할 수 있다는 증거가 증가하고 있으며, 천연물인 생강은 소화 장애, 감기, 피로, 근육통에 사용되었다(Komiljonova, 2024).
생강은 일반가정에서는 생으로 많이 이용되며, 건조한 생강은 건강이라고 하여 약재로 이용되고 있다(Song 등, 2023). 또한, 생강을 건조할 때 원물의 생리활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증자, 증숙 또는 발효 등과 같은 전처리를 병행하여 제조하고 있다(Ban 등, 2010; Chun과 Chung, 2011; Kim 등, 2018). 증기 처리는 천연 제품의 화학적 프로필에 영향을 미치고 생체 활성의 변화를 가져온다(Chan 등, 2007). 인삼을 찌면 구성이 바뀌고 다양한 암 모델에 대한 화학 예방 효과가 증가한다고 보고되었다(Qi 등, 2010; Wang 등, 2006). 인삼 외에도 더덕, 마늘, 도라지 등의 생리활성 효과를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입증되어 다양하게 적용되는 방법이다(Ho와 Su, 2014; In 등, 2017; Jung 등, 2012; Park 등, 2019).
증자처리는 생강이 가진 유효성분들의 구성 비율이나 함량에 영향을 미치며, 건조 생강에 비해 높은 암세포 증식률 감소, 항산화능, 항궤양 활성 등과 같은 이로운 효과들이 보고되었다(Azian 등, 2004; Cheng 등, 2011; Kim 등, 2018; Shin 등, 2020). 찐 생강의 연구에서 찐 생강은 생강 추출물보다 독성이 낮고 효능이 더 높으며, 당뇨병이 있는 쥐에서 항고혈당 활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Nam 등, 2020). 또한, 찐 생강이 항비만 효과가 있음을 보고하였으며(Kim 등, 2021),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의 성장을 억제할 뿐만 아니라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에 의해 유발된 염증을 약화한다고 보고되었다(Song 등, 2021).
본 연구에서는 생강을 이용한 제품을 개발하기 전 생강 분말인 증포 처리 유 ․ 무에 따른 이화학적 특성과 항산화 활성을 비교하여 증포 처리한 생강 분말을 이용한 제품개발의 가능성을 조사하고자 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생강은 껍질을 제거하고 수세한 후, 0.4-0.5 cm 두께로 자른 후 대조군은 식품건조기의 40°C에서 3시간 건조한 시료를 이용하였고, 실험군은 지름 60 cm 찜기를 이용하여 100°C에서 30분 찐 후 리큅 식품 건조기(LD-918TH, Zhejiang Chubiai Electrical Appliance Co., Wuyi, China)의 40°C에서 3시간 건조하여 찌는 과정을 생략한 대조군과 증포 처리 과정을 3회, 6회, 9회 반복한 실험군으로 계획하였다. 모든 생강은 분쇄기(HGR-2000, Hibell Co., Hwaseong, Korea)를 이용하여 분말로 제조하고 100 mesh 체로 체질하여 사용하였다.
찌는 과정을 생략한 대조군과 증포 처리 과정을 3회, 6회, 또는 9회 반복한 실험군의 생강 분말의 일반성분은 AOAC (2000) 방법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수분함량은 드라이 오븐(JSR JSOF-150, JS Research Inc., Gongju, Korea)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조단백질 함량 측정은 Kjeldahl 법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조지방 함량은 Soxhlet 방법을 사용하여, 각 샘플 2 g에 95%(v/v) hexane 150 mL를 첨가하여 8시간 동안 추출하였다. 회분 함량은 회화로를 이용하여 600°C에서 8시간 동안 연소하였다. 탄수화물 함량은 차감법을 이용해 100에서 수분, 조단백질, 조지방과 조회분 함량을 제외한 값으로 하였다. 각 성분은 샘플 당 각각 6회 반복 측정하였다.
생강 분말의 pH는 Lee(2023)의 실험방법을 변형하여 측정하였다. 즉 생강 분말을 증류수에 10배 희석해서 vortex mixer로 1분간 균질화한 후 5분간 방치하고 원심분리기(Combi 514R, Hanil Co., Gimpo, Korea)에서 4°C, 1,008 ×g에서 20분간 원심분리해서 상층액 5 mL를 채취하여 pH meter (Orion Research Inc., Boston, MA, USA)로 측정하였다. 모든 시료는 4회 반복 측정한 후 평균값으로 하였다.
구증구포 생강 분말의 색도는 petri dish(35×10 mm)에 넣어 색차계(CR-400, Minolta Co., Ltd, Tokyo, Japan)를 사용하여 L(lightness), a(redness) 및 b(yellowness) 값을 측정하였다. 각 시료는 10회 반복 측정 후 평균값을 구하였다. 측정 시 사용한 표준 백색판의 명도 L* 값은 82.11, 적색도 a* 값은 −5.85, 황색도 b* 값은 22.03이었다.
증포 처리(0, 3, 6, 또는 9회)한 후 갈아서 체로 거른 생강 분말 각각 100 g에 80%(v/v) 에탄올 1.5 L를 첨가한 후 환류 냉각관을 부착한 65°C의 히팅 맨틀(Mtops ms-265, Seoul, Korea)을 이용하여 3시간 간격으로 3회 추출한 다음 Whatman No. 2 여과지를 사용하여 여과하였다. 여액을 40°C 수욕 상에서 회전 진공 농축기(NNC-1100, EYELA, Tokyo, Japan)를 사용하여 용매를 제거한 후 감압 ․ 농축 ․ 건조하여 시료로 사용하였다.
총폴리페놀 함량은 Folin-Denis법(Folin과 Denis, 1912)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생강 추출물 1 mL와 Folin reagent 2 mL를 시험관에 취한 후 실온에서 3분간 정치하였다. 그 후 10% Na2CO3 2 mL를 첨가하여 혼합 후 30°C에서 40분간 정치한 다음 ELISA microplate reader(Model 680, Biorad Laboratories Inc., Hercules, CA, USA)를 이용하여 76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표준곡선은 gallic acid(Sigma Co, St. Louis, MO, USA)를 표준물질로 하여 최종 농도가 0-500 μg/mL가 되도록 조제 후 검량곡선을 통해 시료의 총폴리페놀 함량을 구했다.
총플라보노이드 함량은 Um과 Kim(2007)의 방법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생강 추출물 1 mL에 di-ethylene glycol 2 mL와 1 N NaOH 20 μL를 넣어 37°C water bath에서 1시간 동안 반응시켰다. ELISA microplate reader로 420 nm에서 시료의 흡광도를 측정하였고, quercetin(Sigma Co, St. Louis, MO, USA)을 표준물질로 이용하여 최종 농도가 0-500 μg/mL가 되도록 검량곡선을 이용하여 총플라보노이드 함량을 구하였다.
2,2-Diphenyl-1-picrylhydrazyl(DPPH) radical 소거능은 Blois 방법(Blois, 1958)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생강 추출물 1 mL와 0.2 mM DPPH 1 mL를 시험관에 취한 후 혼합하여 37°C에서 30분간 반응시켜 517 nm에서 ELISA microplate reader를 사용하여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시료 추출물의 DPPH radical 소거능(%)은 (1 − 시료 첨가구 흡광도 / 무첨가구 흡광도) × 100으로 계산하였다.
2,2-Azino-bis-3-ethylbenzothiazoline–6-sulfonic acid(ABTS) radical 소거능의 측정은 Re 등(1999)의 방법을 응용하여 측정하였다. 7.4 mM ABTS 용액과 2.6 mM potassium persulfate 용액을 제조하여 동일한 비율로 혼합한 다음 ABTS radical 양이온(ABTS+) 생성을 위해 암소에서 24시간 동안 반응시켰다. 그 후 ABTS+ 용액을 734 nm에서 0.7-1.0±0.02의 흡광도가 나타날 때까지 에탄올로 희석하였다. 시료 추출물 0.1 mL와 ABTS+ 용액 0.9 mL를 혼합 후 37°C에서 30분 동안 반응시켰다. 무첨가군은 시료 대신 에탄올을 이용하였으며, 흡광도는 ELISA microplate reader를 사용하여 734 nm에서 측정하였다. ABTS radical 소거능(%)은 [1 − (Abssample / Absblank)] × 100으로 계산하였다.
Ferric reducing antioxidant power(FRAP) 측정은 Benzie와 Strain(1996)의 방법을 응용하여 측정하였다. 실험에 사용되는 working solution은 40 mM HCI에 용해한 10 mM 2,4,6-tripyridyl-s-triazine(TPTZ)과 20 mM FeCl3 ․ 6H2O, 300 mM sodium-acetate 완충용액(pH 3.6)을 실험 직전에 각각 1:10:10의 비율로 혼합 후 37°C에서 10분간 반응시켰다. 시료 추출물 5 μL에 working solution 145 μL를 혼합하고, 무첨가군은 시료 추출물 대신 증류수를 넣었으며 색차 대조군은 buffer를 넣었다. 37°C에서 15분간 암반응 시킨 후 microplate spectrophotometer (Epoch 2, Bio Tek Inc., Winooski, VT, USA)를 사용하여 593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증포 처리 횟수에 따른 생강 분말의 일반 성분에 대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증포 처리 횟수에 따른 생강 분말의 수분함량은 9회 처리군이 6.51%로 가장 낮았으며, 6회 처리군이 7.26%로 가장 높게 나타나 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1). Song 등(2023)은 증자처리를 한 후 건조된 생강의 수분함량은 0.20-8.09%로 나타났는데, 본 연구에서도 증자 건조처리한 생강 분말의 수분함량이 6.51-7.26%로 Kim(2008)이 저장 및 유통을 위해 10% 이하의 수분함량을 나타내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제시한 범위에 속하였으며, Kim 등(2023)은 생강의 건조방식에 따라 수분함량이 2.17-4.65%를 나타냈음을 보고하였는데 이는 본 연구 결과와는 낮은 수치로 실험조건에 따라 차이는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수분함량이 3회 처리에 비해 6회 처리에 증가하였다가 9회 처리에 다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9회 이상 실험이 이루어지지 않아 경향을 알 수 없었으며, 이는 찌고 건조시키는 과정에서 샘플 채취, 실험 오차 등의 원인이 있을 수 있으며, 이와 유사한 실험이 없어 비교하기는 어려웠다.
증포 처리 횟수에 따른 생강 분말의 조단백 함량은 2.36-4.11% 범위로 대조군이 4.11%로 가장 높았고, 3회 처리군과 6회 처리군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대조군에 비해 처리군이 유의하게 낮았다(p<0.001). Kim 등(2008)은 구증구포 인삼의 조단백질의 함량이 감소하였다고 하였는데 이는 단백질 속에는 수많은 효소 등이 존재하며 열에 매우 불안정하여 쉽게 변성되어 불활성화되거나 열에 의해 아미노산으로 전환된다고 추정하였다. Yu 등(2022)은 건조된 인삼을 로스팅 처리를 통한 홍삼 제조과정에 따라서 1, 3, 5, 7 또는 9회 증포된 각각의 홍삼의 조단백질의 함량을 조사한 결과, 로스팅 처리 횟수가 증가할수록 조단백 함량은 감소하였는데 열처리는 수분함량을 감소시키고 세포벽을 파괴하여 유기물질의 용출 또는 파괴를 초래하고 단백질 함량을 변화시킨다고 하였다(Jang 등, 2018). 본 연구에서도 대조군에 비해 증포 처리한 생강의 조단백 함량이 감소한 것은 증포 과정을 거치면서 조단백질이 가열에 의해 분해되어 단백질 함량이 감소된 것으로 생각되며, 9차에서 증가한 것은 수분함량의 차이나 실험 오차에 의한 것으로 보이나 생강을 구증구포 처리하여 조단백질 함량을 측정한 연구가 없어 상호 비교하기 어려웠다.
증포 처리 횟수에 따른 생강 분말의 조지방 함량은 6.85-7.82% 범위로 대조군이 7.8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9회 처리군이 6.85%로 가장 낮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1). Kim 등(2008)은 인삼의 구증구포에 의한 조지방 함량은 증포 횟수가 증가할수록 함량이 감소하였다고 보고하였으며, 이는 조지방이 열에 불안전한 상태에서 가열에 의해 쉽게 분해되며 휘발성 향기 성분 등으로 전환되어 감소하였다고 보고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도 증포 횟수가 증가할수록 조지방 함량이 감소한 것은 동일한 이유로 생각된다.
회분 함량은 대조군이 8.32%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6회 처리군이 7.75%, 3회 처리군과 9회 처리군이 각각 7.47%와 7.51%로 가장 낮으며, 3회와 9회 처리군간에는 차이가 없었으나 대조군에 비해 처리군이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p<0.001).
증포 처리 횟수에 따른 생강 분말의 탄수화물 함량은 72.79-76.15% 범위로 대조군이 72.79%로 가장 낮았으며, 9회 처리군이 76.15%로 가장 높게 나타나 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1).
Table 2는 증포 처리 횟수에 따른 생강 분말의 pH를 나타낸 결과이다. 증포 처리 횟수에 따른 생강 분말의 pH는 대조군이 8.66으로 가장 높았고, 3회 처리군은 7.53, 6회 처리군은 7.64, 9회 처리군은 7.44로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p<0.001). Oh 등(2013)의 생지황과 숙지황 분말의 pH 측정에서 숙지황 분말의 pH가 생지황 분말보다 낮았는데 이는 생지황을 숙지황으로 만들 때 발효에 의해 pH가 낮아진 것으로 사료된다고 하였다. Choi 등(2008)의 연구에서 생마늘과 흑마늘의 pH는 생마늘보다 흑마늘에서 더 큰 폭으로 산성화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pH의 변화는 비효소적 갈변반응 시 생성되는 전구물질인 공액 불포화 카보닐화합물의 작용과 숙성 기간 중 당 등의 성분 변화에 의해 생성되는 유기산에 의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하였는데 시료나 실험방법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구증구포 과정 중 생성된 유기산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 Number of steam-drying treatments | F-value | ||||
|---|---|---|---|---|---|
| 0 | 3 | 6 | 9 | ||
| pH | 8.66±0.011)d2) | 7.53±0.01b | 7.64±0.01c | 7.44±0.01a | 78,883.79***3) |
증포 처리 횟수에 따른 생강 분말의 색을 나타낸 사진은 Fig. 1에 제시하였으며, 색도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증포 처리 횟수에 따른 생강 분말의 명도는 대조군이 68.59로 가장 높았고 3회, 6회, 9회 처리군의 명도는 각각 52.78, 50.82, 50.14로 처리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낮게 나타났으며 Fig. 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생강 분말의 색이 처리 횟수가 많을수록 점점 짙어지는 경향을 나타냈다. 찌고 건조시킨 횟수에 따른 생강 분말의 적색도는 3.63-7.26의 범위로 대조군보다 9회 처리군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황색도는 27.94-33.97 범위로 대조군이 가장 높게 나타냈으며 모든 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Jun 등(2016)은 삼채 뿌리를 증포 처리한 결과, 증포 처리 횟수가 증가할수록 갈변도가 증가하였음을 보고하였고, 이는 식물에 존재하는 당과 유리아미노산이 열처리 과정 중에 반응하여 생성되는 갈변 물질의 증가(Maillard와 Caramelization 반응)로 갈색도가 증가하기 때문으로 설명하였다(Lertittikul 등, 2007). 증포 횟수에 따른 흑삼의 분말 시료 색도 측정(Nam 등, 2012)에서 명도는 증숙 처리 횟수의 증가에 따라 서서히 감소하였고, 적색도는 1회 처리부터 3회 처리까지 증가하다가 4회 처리 후부터는 감소하는 경향이었으며, 황색도는 증숙 처리횟수 증가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으로 나타났는데, 본 연구와 비교했을 때 명도와 황색도는 동일한 경향이었고, 적색도는 본 연구에서는 증가하는 경향이었으나 흑삼의 경우 반대되는 경향을 나타냈다. Kim 등(2023)은 건조방식에 따른 생강의 색도에서 명도는 74.5-83.2, 적색도는 0.5-2.8, 황색도는 30.2-31.4로 측정되었는데 명도는 본 연구 결과보다 높았고, 적색도는 낮았으며, 황색도는 유사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본 연구에서 열처리에 의한 갈변으로 인해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증포 처리 횟수에 따른 생강 분말의 항산화 활성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총폴리페놀 함량은 대조군의 경우 56.19 mg GAE/g에서 3회 증포 처리의 경우 66.88 mg GAE/g, 6회 증포 처리의 경우 79.75 mg GAE/g, 9회 증포 처리 경우 80.48 mg GAE/g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p<0.001). 총플라보노이드 함량은 대조군의 경우 126.33 mg QE/g, 3회 증포 처리의 경우 213.41 mg QE/g, 6회 증포 처리의 경우 231.99 mg QE/g, 9회 증포 처리의 경우 271.71 mg QE/g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p<0.001). DPPH radical 소거능은 대조군의 경우 73.25%, 3회 증포 처리의 경우 76.21%, 6회 증포 처리의 경우 76.88%, 9회 증포 처리의 경우 84.50%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p<0.001). ABTS radical 소거능은 대조군은 93.66%, 3회 증포 처리의 경우 94.84%, 6회 증포 처리의 경우 95.27%, 9회 증포 처리의 경우 95.72%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p<0.001). FRAP 활성은 대조군은 2,824.22 mM FeSO4/g, 3회 증포 처리의 경우 3,320.00 mM FeSO4/g, 6회 증포 처리의 경우 3,543.56 mM FeSO4/g, 9회 증포 처리의 경우 3,840.00 mM FeSO4/g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p<0.001).
본 연구 결과의 모든 항산화 특성 측정 결과에서 생강을 찌고 건조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항산화 활성이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홍삼은 찐 후 건조과정에서 갈색화 반응이 일어나고, 홍삼의 갈변반응에 의해 생성된 갈변물질은 천연 항산화제 및 노화억제 물질로 알려져 있다고 보고(Wattenberg, 1980)된 바 본 연구에서 증포 횟수가 증가할수록 항산화 활성이 증가한 원인 중 하나로 생각된다.
Song 등(2008)의 연구에서 건조조건에 따른 생강의 항산화 활성 측정 결과, 총플라보노이드는 70°C, 8 h의 건조조건에서, 총폴리페놀 함량은 60°C, 6 h의 건조 조건에서 높게 나타났으나 DPPH와 ABTS 라디칼 소거능은 70°C, 8 h의 건조조건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건조조건에 따라 항산화 활성이 다르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증자 처리횟수에 따라 항산화 활성이 높아졌는데 Song 등(2012)은 생강의 증숙 공정 중 생성된 갈변 물질이 자유라디칼을 소거시켜 항산화 효능을 향상시켰다고 보고된 바 있다. Nam 등(2017)은 생강이 증숙 과정을 거치면서 새로운 페놀화합물이 생성될 뿐 아니라 생강 조직의 세포벽이 파괴되어 유용 물질이 많이 용출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였다.
Kim 등(2016)의 연구에서 인삼의 증자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총페놀화합물의 함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흑삼 제조과정 중 증포 과정이 반복됨에 따라 총페놀화합물의 함량이 증가하였으며, Lee 등(2020)은 생강의 증자과정 중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 폴리페놀이 유리형으로 전환되거나 고분자의 페놀성 화합물이 저분자의 페놀성 화합물로 전환된 것으로 사료된다고 보고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도 증포 처리 횟수가 증가할수록 갈변 물질과 유용 물질이 증가되어 항산화 활성이 증가된 것으로 사료된다.
증포 처리한 삼채 뿌리 열수 추출물의 항산화 활성 연구(Jun 등, 2016)에서 증포 온도 및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총폴리페놀 함량이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Kim 등(2023)은 증숙 처리에 따른 재래생강과 중국 생강의 항산화 활성을 연구한 결과 재래생강의 항산화 활성이 높았으며, 총플라보노이드와 총페놀화합물, ABTS radical 소거능은 증숙 6시간에서 가장 높은 함량을 나타내다가 그 이상으로 증숙할수록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음을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실험조건 등의 차이로 본 연구 결과와 비교하기는 어려우나 본 연구에서 3회, 6회, 9회로 증포 처리가 증가할수록 생강의 경우 항산화 활성이 높아짐을 확인하였다.
4. 요약
본 연구는 증포 처리 횟수를 달리하여 제조한 생강 분말의 일반성분, pH, 색도, 항산화 활성을 측정하였다. 증포 처리 횟수에 따른 생강 분말의 수분함량은 전체적으로 6.51-7.26%로 9회 처리군이 가장 낮았으며, 6회 처리군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p<0.001). 조단백 함량은 2.36-4.11% 범위로 대조군이 가장 높았고, 3회 처리군이 가장 낮았다(p<0.001). 조지방 함량은 6.85-7.82% 범위로 대조군이 가장 높았으며, 9회 처리군이 가장 낮았다(p<0.001). 회분 함량은 대조군이 가장 높았고, 6회 처리군, 3회 처리군, 9회 처리군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p<0.001). 증포 처리 횟수에 따른 생강 분말의 pH는 대조군이 가장 높았고, 9회 처리군이 7.44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p<0.001). 증포 처리 횟수에 따른 생강 분말의 명도는 대조군이 가장 높았고 처리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낮게 나타났다. 적색도는 3.63-7.26의 범위로 9회 처리군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황색도는 대조군이 가장 높게 나타냈으며 처리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낮게 나타났다. 구증구포 생강 분말의 항산화 활성에서 총폴리페놀 함량(p<0.001), 총플라보노이드 함량(p<0.001), DPPH radical 소거 활성(p<0.001), ABTS radical 소거 활성(p<0.001) 및 FRAP 활성(p<0.001)은 생강을 증포 처리 횟수가 3, 6, 9회로 증가함에 따라 항산화 활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 구증구포 생강 분말은 대조군에 비해 수분, 회분, 조지방 함량과 pH가 낮았으며, 색도의 경우 명도와 황색도는 낮은 반면 적색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항산화 활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