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쌀(Oryza sativa L.)은 세계 주요 국가에서 중요한 식량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오래전부터 쌀을 주식으로 사용해왔다(Kim 등, 2022b; Sa 등, 2023). 쌀의 총 생산량 중 약 95%는 밥으로 소비되어 왔으며, 가공식품으로 사용되는 양은 총 생산량의 약 2-3%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Choi와 Kim, 2024; Park 등, 2012). 쌀을 주식으로 하는 우리나라는 경제 성장, 식생활의 서구화 및 외식 산업의 발달로 인해 쌀의 소비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Lee, 2018). 국가 통계청에서 쌀 소비량을 조사한 결과, 2014년에는 1인당 연간 소비량이 65.1 kg이었지만, 2023년에는 56.4 kg으로 약 13%가 감소하여 지속적인 쌀 소비량 감소가 발생하고 있다(KOSIS, 2024a). 가구 부문에서 사용되는 쌀 소비량은 감소하고 있지만,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쌀을 활용한 장류, 도시락, 떡류, 탁주 및 약주 제조업 등과 같은 가공식품과 관련된 소비량은 증가하고 있다(KOSIS, 2024b). 따라서 쌀 소비량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져야 된다고 생각한다.
떡은 쌀을 활용한 가공식품 중 하나로 우리나라 전통음식 내에서 가장 다양하게 개발이 진행되고있다(Yang 등, 2022). 증편은 탁주를 이용하여 발효시키는 찌는 떡의 일종으로 조직의 연화로 인해 소화가 용이하고, 노화를 지연시켜 저장성이 우수하다고 알려져 있다(Choi 등, 2021; Kim 등, 2012). 증편을 제조할 때 사용되는 탁주는 곡류와 누룩을 발효시켜 증류하지 않은 형태로 음용하는 전통주이며, 필수 아미노산 및 비타민이 풍부하고 발효 과정에서 유기산이 생성돼 체내 신진대사에 도움을 준다고 보고하였다(Lee와 Cho, 2018). 증편을 제조할 때는 발효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신맛과 단맛을 내는 유기산이 생성되는데, 이로 인해 pH가 감소하여 산에 강한 효모, 젖산균을 제외한 잡균 및 병원성 미생물의 생장을 억제시킬 수 있다(Kim 등, 2022a). 증편 제조 시 사용되는 쌀가루는 밀가루와 다르게 글루텐이 존재하지 않아 가스 포집력이 약하지만, 발효 과정에서 전분의 호화 및 단백질과의 결합으로 인해 팽윤이 일어나 가스를 포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고하였다(Oh와 Oh, 2009). 따라서 증편은 발효 과정에서 형성된 구조 조직이 고운 질감과 우수한 탄력성을 가지기 때문에, 밀가루로 만든 빵과 매우 유사한 식감을 가져 빵을 애호하는 현대인들의 관심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Lee, 2020). 증편과 관련된 선행연구로는 생이스트 첨가 비율에 따른 증편의 품질 특성(Yoon, 2005), 타피오카를 첨가한 증편의 품질 특성(Yoo와 Shim, 2006), 새송이버섯을 첨가한 증편의 품질 특성 연구(Ko와 Kim, 2007), 인삼막걸리로 제조한 증편 연구(Sung과 Han, 2008), rice sourdough를 첨가한 증편의 품질 특성(Oh와 Oh, 2009), 변성전분을 첨가한 증편 연구(Lee 등, 2012), 잡곡을 첨가한 증편의 품질 연구(Sim 등, 2018), 머랭의 첨가량을 달리한 증편의 품질 특성(Kim 등, 2022b), 막걸리 첨가량을 달리한 증편의 품질 특성(Kim 등, 2022a) 등이 있는데, 증편의 품질 특성만을 연구한 논문이 대부분으로 기능성 식품 소재를 첨가하여 활용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와송(Orostachys japonica (Maxim.) A. Berge)은 돌나무과의 바위솔속에 속하는 다년생 식물로 기와 지붕 및 산 위의 바위에서 성장하며(Kim 등, 2012), 여름과 가을에 채취해 뿌리를 제거하고 전초를 건조시켜 예로부터 약용으로 사용되고 있다(Jeon 등, 2022). 와송에는 glutinol, friedelin, glutinone 등의 triterpenoid류, β-sitosterol, campesterol과 같은 sterol 계열, flavonoid, 4-hydroxybenzoic acid, 3,4-dihydroxybenzoic acid, gallic acid 등의 aromatic acid 및 fatty acid ester류와 같은 생리활성 성분들을 함유하고 있어 항암, 항비만, 항균, 항염증, 세포 자멸사 유도 및 항산화 등의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였다(Jung과 Choe, 2016). 인간의 체내에 산소가 들어가면 불완전하게 환원이 발생해 활성산소(reactive oxygen species, ROS)가 생성되고, 이는 free radical 형태로 유전자에 직접적인 손상을 입혀 유전자의 돌연변이 및 암세포화가 발생할 수 있다(Choi, 2013). 항산화는 ROS가 발생시키는 free radical을 제거하고 체내 ROS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기작으로, 와송에는 항산화 활성이 우수한 성분들이 많아 기능성 식품 소재로서의 활용도가 높아질 전망으로 보인다(Yoon 등, 2009).
와송에 관한 선행연구로는 와송 추출물의 페놀 및 플라보노이드의 항산화 활성 비교(Jin 등, 2016), 와송 용매별 분획 추출물의 항산화, 항균 및 암세포 독성 비교(Kim 등, 2017), 유지 기질에 대한 와송 추출물의 항산화 연구(Lee 등, 2008a), 와송 추출물의 비만 유발 ICR 마우스의 항비만 효과(Lee와 Lee, 2017), 와송 추출물의 면역 기능 개선 효과 및 안전성에 관한 연구(Choi 등, 2017), 와송의 생리활성 물질 생산 증가를 위한 마이크로파 추출 공정 개발에 관한 연구(Kim 등, 2024), 와송 추출물의 항산화 및 생리 활성(Lim 등, 2017) 등으로 와송의 생리활성에 관한 연구는 많이 존재하지만, 와송을 활용하여 식품 개발에 활용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쌀 소비량을 증가시키기 위한 쌀 가공식품 개발의 일환으로 와송 분말을 첨가한 증편을 제조하여 품질 특성, 항산화 활성, 기호도 및 특성 강도를 측정해 기능성 소재로서 와송의 활용도를 확인하고, 최적의 배합비를 제시해 기능성 식품 개발의 기초자료로 사용되고자 한다.
2. 재료 및 방법
본 연구의 습식 제분 멥쌀가루(Ssarijai, Jeongeup, Korea)와 와송 분말(Gimcheon Wasong, Gimcheon, Korea)은 2024년 10월에 인터넷을 통해 구입하였고, 소금(CJ Cheiljedang, Shinan, Korea), 설탕(CJ Cheiljedang, Incheon, Korea), 막걸리(Seoul Takju, Jincheon, Korea)는 시중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Folin Ciocalteau’s phenol reagent, 2,2-diphenyl-1-picrylhydrazyl (DPPH), 2,2'-azino-bis(3-ethylbenzothiazoline-6-sulfonic acid) (ABTS), gallic acid, quercetin, diethylene glycol, potassium ferricyanide, ferric chloride 등의 시약은 Sigma-Aldrich Chemical Co.(Seoul, Korea)의 제품을 사용하였고, NaOH, potassium persulfate, Na2CO3 등의 시약은 Daejung Chemcals & Metals Co.(Siheung, Korea)의 제품을 사용하였다. 그 외에 사용된 시약은 1급을 사용하였다.
증편의 배합비는 Ko 등(2023)의 방법을 참고해 결정하였으며, 예비실험 결과 와송 분말을 멥쌀가루 대비 10% 이상 첨가 시 증편의 형태가 붕괴될 정도로 품질이 과도하게 저하되어 최종 배합비는 Table 1에 나타내었다. 와송 분말은 멥쌀가루 대비로 첨가하여 제조하였다. 멥쌀가루와 와송 분말은 32 mesh 체에 2번 내려서 준비하였고, 계량한 설탕과 소금에 40°C로 데운 물을 첨가해 천천히 녹여주었다. 막걸리는 27°C로 데워 설탕과 소금이 녹은 물에 넣어준 뒤, 준비된 멥쌀가루와 와송 분말에 섞어주었다. 반죽이 완성되면 반죽 전용 용기에 담아 incubator(LTI-700, Eyela, Tokyo, Japan)에 넣고 37±1°C에서 4시간 동안 1차 발효를 하였다. 4시간이 지나면 반죽을 꺼내어 발효 과정에서 형성된 가스를 주걱으로 잘 저어서 빼주고, 다시 incubator에 넣고 2시간 동안 37±1°C에서 2차 발효를 실시하였다. 2차 발효까지 완료된 반죽은 가스를 마지막으로 빼주고 25 mL 실리콘 틀(WSK570, Sillymann, Seoul, Korea)에 25 g씩 계량한 뒤, 내부 온도를 35±2°C로 맞춘 찜기(HY-2020, Hanyang Guemsok, Pocheon, Korea)에서 3차 발효를 20분간 실시하였다. 3차 발효가 완료되면 찜기의 온도를 120°C로 올려 20분간 쪄내고, 10분간 뜸을 들인 후 30분간 방랭하여 시료로 사용하였다.
와송 분말 첨가에 따른 증편의 수분함량은 시료를 0.5 g씩 얇게 잘라 infared moisture analyzer(MJ33, Mettler Toledo, Zurich, Swizerland)를 활용하였고, 각각의 시료를 5회 반복 측정하여 평균값±표준편차로 나타내었다.
와송 분말 첨가에 따른 증편의 pH는 반죽 직후, 1차 발효, 2차 발효, 증편의 pH까지 총 4번을 측정하였다. 반죽은 3 g에 증류수 27 mL를 가해 혼합한 것을 여과지(Whatman No. 2, Whatman Ltd., Piscataway, NJ, USA)로 여과하였고, pH 측정기(FEP-20, Mettler Toledo)로 측정하였다. 완성된 증편은 증편 5 g에 증류수 45 mL를 가하여 homogenizer (Polytron PT 2500 E, Kinematica, Luzem, Switzerland)로 교반하였다. 교반된 증편은 여과지를 활용하여 여과한 후 동일하게 pH meter로 측정하였다. 각각의 시료는 3회 반복 측정하여 평균값±표준편차로 나타내었다.
와송 분말 첨가에 따른 증편의 비체적은 종자치환법(AACC, 2000)을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비체적이란 단위 질량당 체적을 나타내며, 종자치환법으로 부피를 측정하고 질량을 측정한 뒤 질량에 대한 부피의 비(mL/g)를 아래의 식을 활용하여 나타내었다. 팽창률은 증편의 상단 중심 값을 측정하고 양 옆 높이는 평균값을 사용하여 아래의 식으로 나타내었다. 증편의 비체적과 팽창률은 5회 반복 측정하여 평균값±표준편차로 나타내었다.
와송 분말 첨가에 따른 증편의 색도는 colormeter(CR-400, Konica Minolta Co., Osaka, Japan)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증편 외부의 L값(lightness), a값(redness, +red/-green), b값(yellowness, +yellow/-blue)을 각각의 시료마다 20회 반복 측정하여 평균값±표준편차로 나타내었다. 사용한 백색관의 표준값은 L=94.64, a=−0.45, b=4.11이다.
와송 분말 첨가에 따른 증편의 조직감은 2×2×2 cm3로 성형한 증편을 texture analyser(TA-XT2, Stable Micro System Ltd., Haslemere, UK)로 측정하였다. 측정 조건은 Table 2의 조건으로 경도(hardness), 부착성(adhesiveness), 탄력성(springiness), 응집성(cohesiveness), 검성(gumminess), 씹힘성(chewiness)을 각각의 시료마다 15회 반복 측정하여 평균값±표준편차로 나타내었다.
| Measurement | Value |
|---|---|
| Strain | 70% |
| Test speed | 1.0 mm/s |
| Pre-test speed | 2.0 mm/s |
| Post-test speed | 5.0 mm/s |
| Trigger force | 5.0 g |
| Plunger | 75 mm/s |
와송 분말 첨가에 따른 증편의 단면 및 기공 측정은 Choi 등(2022)의 방법으로 예비실험을 진행한 다음 본 연구에서 시행하였다. 각 증편의 횡단면은 레이저 복합기(SL-M2680N, Samsung, Suwon, Korea)의 스캔 기능을 통해 600 dpi 수준으로 스캔하여 344×344 pixel로 잘라 Image J program(Image J,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Nethesda, MD, USA)으로 기공의 수와 크기를 분석하였다. 기공의 수 및 크기는 각각의 시료마다 5회 반복 측정하여 평균값±표준편차로 나타내었다.
와송 분말 첨가에 따른 증편의 추출액은 증편 10 g에 70% ethanol 90 mL를 가해 stomacher(HG400V, Mayo International SR., MI, Italy)로 2분간 친 다음 shaking incubator(SI-900R, Jeio Tech, Kimpo, Korea)에 넣어 130 rpm 수준으로 24시간 추출하였다. 추출액은 여과하여 시료액으로 사용하였다.
각 증편의 총폴리페놀 함량은 Hillis와 Swain(1959)의 방법으로 측정하였다. 시료액 100 μL에 2 N Folin-Ciocalteu’s phenol reagent 200 μL와 증류수 2 mL를 가해 vortexing 한 후 3분간 암실에서 반응시켰다. 총폴리페놀 함량 측정의 대조군은 시료액 대신 증류수를 100 μL 넣고 실시하였다. 3분이 지난 반응액은 0.1 M Na2CO3 용액 2 mL를 추가로 가하여 1시간 동안 암실에서 반응시켰다. 반응이 완료되면 분광광도계 spectrophotometer(Libra S22, Biochrom Ltd., Cambridge, UK)에서 폴리페놀 함량 측정을 위한 흡광도 765 nm로 설정한 뒤 측정하였다. 총폴리페놀 측정을 위한 표준물질로는 gallic acid를 사용하여 표준곡선으로 나타내었다. 총폴리페놀 함량 측정은 mg gallic acid equivalent(mg GAE/g)로 표시하였고, 각각의 시료액마다 4회 반복 측정하여 평균값±표준편차로 나타내었다.
각 증편의 총플라보노이드 함량은 Davis 방법에서 변형한 Um과 Kim(2007)의 방법에 준하여 측정하였다. 시료액 100 μL에 1 N NaOH 100 μL, 90% diethylene glycol 1 mL를 가해 vortexing 한 뒤, 37°C의 sousvide machine(SVC-AC2E, Polyscience, Niles, Illinois, USA)에서 1시간 동안 반응시켰다. 총플라보노이드 함량 측정의 대조군은 시료액 대신 증류수를 100 μL 넣어 실시하였다. 반응이 완료된 시료는 vortexing 후 spectrophotometer에서 플라보노이드 함량 측정을 위한 흡광도 420 nm로 설정하여 측정하였다. 총플라보노이드 측정을 위한 표준물질로는 quercetin을 사용하여 표준곡선으로 나타내었다. 총플라보노이드 함량 측정은 mg quercetin equivalent(mg QE/g)로 표시하였고, 각각의 시료액마다 4회 반복 측정하여 평균값±표준편차로 나타내었다.
각 증편의 1,1-diphenyl-2-picryl-hydrazy(DPPH) radical 소거 활성은 Lee 등(2007)의 방법을 준수하여 측정하였다. DPPH 용액은 0.15 mM에 ethanol 99.9% 100 mL를 정용하여 제조하였다. 시료액 1 mL에 DPPH 용액 250 μL를 가하고 vortexing 한 뒤 30분간 암실에서 반응시켰다. DPPH radical 소거 활성 측정의 대조군은 시료액 대신 70% ethanol을 가하여 측정하였다. 반응이 완료된 시료는 vortexing을 하여 spectrophotometer에서 흡광도 517 nm로 측정하였고, radical 소거 활성은 아래의 식으로 계산하였다. 흡광도는 각각의 시료액마다 4회 반복 측정하여 평균값±표준편차로 나타내었다.
각 증편의 2,2’-azino-bis(3-ethylbenzothiazoline-6-sulfonic acid)(ABTS) radical 소거 활성은 Siddhuraju와 Becker(2007)의 방법을 준수하여 측정하였다. ABTS를 증류수에 용해해 제조한 7.0 mM ABTS+와 potassium persulfate를 증류수에 용해해 제조한 2.45 mM 수준의 용액을 혼합하여 16시간 이상 암실에서 반응시켰다. 반응시킨 ABTS+ solution은 99.9%의 ethanol로 희석시켜 spectrophotometer에서 흡광도 값이 0.70±0.02 수준으로 되도록 설정하였다. 시료액 100 μL에 ABTS+ solution 900 μL를 가하여 spectrophotometer에서 흡광도 734 nm로 측정하였다. ABTS+ radical 소거 활성 측정의 대조군은 시료액 대신 70% ethanol 100 μL를 가하여 측정하였다. 측정은 1분 간격으로 총 6분 간 측정하였고, 각각의 시료액마다 4회 반복 측정한 값을 아래의 식을 사용하여 평균값±표준편차로 나타내었다.
각 증편의 환원력은 Oyaizu(1986)의 방법을 준수하여 측정하였다. 시료액 1 mL에 1% potassium ferricyanide 1 mL, pH를 6.6으로 맞춘 0.2 M sodium phosphate buffer 1 mL를 가하여 vortexing 한 후 50°C sousvide machine에서 20분간 반응시켰다. 반응이 완료된 시료액에 10% trichloroacetic acid 1 mL를 가하고 vortexing 후 원심분리기(Combi-514R, Hanil, Daejeon, Korea)로 10분간 3,000 rpm 수준으로 실시하여 상등액 2 mL를 따로 취하였다. 증류수 2 mL에 취한 용액 2 mL와 0.1% ferric chloride 400 μL를 가하여 측정하였다. Spectrophotometer에서 사용한 흡광도는 700 nm에서 측정하였고, 각각의 시료액마다 4회 반복 측정하여 평균값±표준편차로 나타내었다.
와송 분말 첨가에 따른 증편의 관능검사는 동일한 연령대 30명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진행 전 실험의 목적, 평가 항목에 관해 설명하였으며,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진행하였다. 각 증편은 제조 후 20°C 상온에서 30분간 방랭하고, 2×2×2 cm3의 크기로 성형한 것들을 흰색 폴리에틸렌 접시에 담아 난수표를 활용하여 제공하였다. 소비자 기호도 평가 항목은 외관(appearance & color), 향미(flavor & taste), 조직감(texture), 전반적인 기호도(overall acceptance) 총 4가지 항목으로 설정하였고, 각 항목은 7점 척도법(1점: 매우 나쁨, 4점: 보통, 7점: 매우 좋음)을 이용하여 평가하였다. 특성 강도 평가는 기호도 평가와 동일하게 7점 척도법(1점: 매우 약함, 4점: 보통, 7점: 매우 강함)으로 실시하였고, 단맛(sweetness), 막걸리의 향(flavor of makgeolli), 와송의 향(flavor of O. japonica), 씹힘성(chewiness)으로 총 4가지 항목을 평가하였다. 본 연구는 공주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규정에 따라 진행하였다(KNU_IRB_2024-117).
본 연구에서 진행한 모든 실험 결과의 통계는 IBM SPSS statistics(Ver 27.0, SPSS Institute Inc., IBM Corp., Armonk, NY, USA)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평균값±표준편차로 나타내었다. 프로그램에서 각각의 시료간의 유의성을 파악하기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석인 ANOVA 검정과 Duncan’s multiple range test로 p<0.05 수준에서 유의성을 검정하였다. 항산화 활성 상관관계는 pearson 상관계수(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활용하여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와송 분말 첨가에 따른 증편의 수분함량은 Table 3에 나타내었다. 증편의 수분함량은 CON이 46.04%로 측정되었고, 와송 분말 2%, 4%, 6%, 8% 첨가 시 각각 45.57, 45.05, 44.21, 43.08%로 와송 분말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값이 감소하였다(p<0.001). 본 연구에서 사용된 멥쌀가루와 와송 분말의 수분함량은 각각 39.74, 6.60%로 측정되었다. 증편의 수분함량이 감소한 것은 와송 분말의 수분함량이 멥쌀가루보다 낮아 와송 분말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수분함량이 감소한 것으로 사료된다. 와송 분말을 첨가한 절편 연구(Hwang, 2024)에서도 와송 분말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수분함량이 감소하여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는데, 이는 부재료가 가지고 있는 수분함량과 관계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Ko 등(2023)의 늙은 호박 분말 증편 연구에서 호박 분말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증편의 수분함량이 감소하였으며, 증편 반죽이 호화되는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수분을 부재료의 식이섬유가 흡수해 수분함량이 감소한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수분함량이 감소한 이유는 와송이 보유하고 있는 식이섬유가 증편의 수분을 흡수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CON, no O. japonica powder added; OJ 2%, added O. japonica powder at 2%; OJ 4%, added O. japonica powder at 4%; OJ 6%, added O. japonica powder at 6%; OJ 8%, added O. japonica powder at 8%.
와송 분말 첨가에 따른 증편의 pH 측정 결과를 Table 3에 나타내었다. 1차 발효를 실시하기 전 반죽의 pH는 CON이 5.44로 가장 낮게 측정되었고, 와송 분말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5.76-6.00으로 증가하였다(p<0.001). 본 연구에서 사용된 막걸리와 와송 분말 10, 20, 30, 40 g을 혼합한 시료의 pH는 각각 4.89, 5.03, 5.08, 5.15로 측정되었다. 비파잎 분말을 첨가한 증편 연구(Choi 등, 2021), 연잎 가루를 첨가한 증편 연구(Kim과 Park, 2010)에서도 분말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pH가 증가해 본 연구에서도 와송 분말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반죽의 pH가 높아진 것으로 보여진다. 1차 발효가 완료된 반죽의 pH는 CON부터 와송 분말 첨가 8%까지 첨가 시 4.99-5.66으로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증가하였으며(p<0.001), 2차 발효가 완료된 반죽의 pH는 4.68-5.48로 와송 분말을 첨가할수록 높게 측정되었다(p<0.001). 증편의 반죽은 발효 과정을 거치면서 pH가 감소하였는데, 막걸리 첨가량을 달리한 증편 연구(Kim 등, 2022a), 막걸리 첨가량을 달리한 개량 증편 연구(Ko 등, 2022)에서도 발효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pH가 감소하는 결과를 보고하여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블루베리 분말을 첨가한 증편 연구(Lee와 Kim, 2018)에서 pH가 감소하는 이유는 발효 진행 과정에서 반죽의 해당 작용 및 젖산 발효에 의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Park과 Suh(1994)는 증편 반죽에 첨가한 탁주가 발효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젖산의 함량이 증가하여 pH가 감소한다고 하였고, Han 등(1997)의 술덧 연구에서도 막걸리를 첨가하고 발효 시간이 증가할수록 총 산의 함량이 증가하여 pH가 감소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증편 반죽이 발효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막걸리에 존재하는 유기산의 함량 증가 및 반죽 내부에서 해당작용이 발생하여 pH가 감소하였다고 사료된다. 증자 후 증편의 pH는 CON부터 와송 분말 첨가 8%군까지 2차 발효 직후의 pH보다 높은 4.86-5.55로 측정되었다(p<0.001). Ko 등(2023)의 늙은 호박 분말 첨가 증편 연구에서도 증자 후 증편의 pH가 2차 발효보다 높은 값을 나타내었는데, 이는 고온에서 증자하는 과정 중 유기산의 휘발 및 성분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하여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와송 분말 첨가에 따른 증편의 비체적은 Fig. 1에 나타내었다. 증편의 비체적은 CON이 1.44 mL/g으로 가장 높게 측정되었고, 와송 분말 2%, 4%, 6%, 8% 첨가 시 각각 1.39, 1.32, 1.26, 1.23 mL/g으로 분말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값이 감소하였다(p<0.05). 증편의 반죽은 발효과정에서 단백질과 당질의 결합으로 인해 가스를 형성할 수 있고, 반죽을 증자하게 되면 전분이 호화되면서 다공성의 구조를 형성한다고 알려져 있다(Oh와 Oh, 2009). 블랙티 분말을 첨가한 증편 연구(Min, 2024)에서도 블랙티 분말이 증가할수록 증편의 비체적이 감소하였는데, 첨가한 블랙티 분말이 수분을 흡수하여 가열 과정에서 부피가 감소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Lee(2015)는 반죽의 pH가 부피 및 팽창률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는데, pH가 증가하면 반죽의 CO2가 감소하여 부피가 감소한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와송 분말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비체적이 감소한 이유는 쌀가루 대비 첨가한 와송 분말로 인해 전분의 호화도가 감소하였으며, 와송 분말이 반죽 과정에서 수분의 흡수 및 pH의 증가를 유발하였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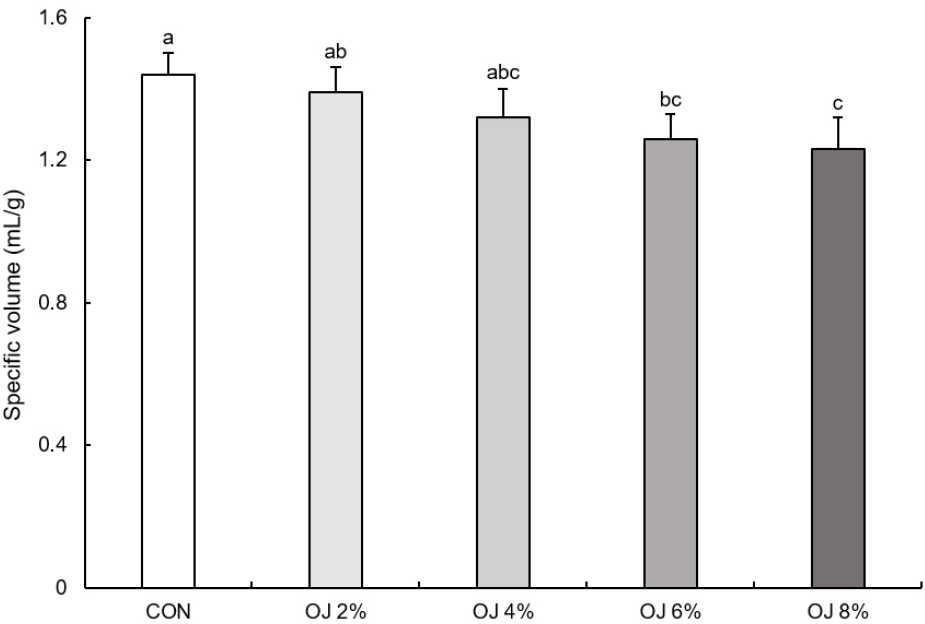
증편의 팽창률은 Fig. 2에 나타내었다. CON이 비체적과 동일하게 155.23%로 가장 높았고, 와송 분말 2%, 4%, 6%, 8% 첨가 시 각각 153.17%, 152.75%, 151.73%, 149.79%로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값은 감소하였으며, CON부터 4%까지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지만, 6% 이상 첨가군에서는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다(p<0.05). 팽창률은 가장 높은 상단 부분의 팽창된 정도를 확인하는 것이고, 일정한 무게로 틀에 계량한 증편은 부피가 증가할수록 팽창률도 높아진다고 보고하였다(Ko 등, 2023b). 본 연구에서 와송 분말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팽창률이 감소한 것은 증편의 부피가 팽창률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사료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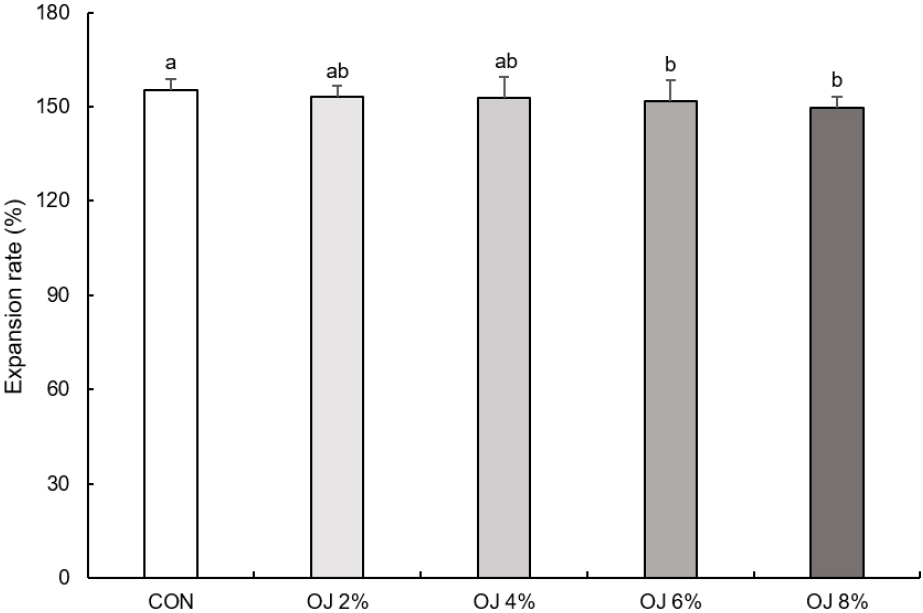
와송 분말 첨가에 따른 증편의 색도는 Table 4에 나타내었다. L값은 CON이 72.72로 가장 높게 측정되었고, 와송 분말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59.03-34.09로 값이 감소하였다(p<0.001). a값은 L값과 대조적으로 CON이 −1.33, 와송 분말을 첨가할수록 3.67-7.19로 값이 증가하였다(p<0.001). b값은 CON이 1.45로 측정되었고, 와송 분말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13.05-15.39로 값이 증가하였다(p<0.001). Hwang(2024)의 와송 분말을 첨가한 절편 연구에서도 와송 분말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L값이 감소하고, a값과 b값은 증가해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Lee 등(2009)의 와송 추출물 연구에서 와송은 클로로필 및 플라보노이드 같은 색소 성분이 다량으로 존재해 L값이 감소하고, a값과 b값은 증가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증편 제조에 사용한 멥쌀가루의 L값은 89.72, a값 −1.32, b값은 2.83을 나타내었으며, 와송 분말은 L값 57.63, a값 5.54, b값 17.91로 측정되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와송 분말은 멥쌀가루에 비해 L값이 낮고, a값과 b값이 높아 와송 분말의 첨가가 최종적으로 L값을 감소시키고, a값과 b값을 증가시킨 것으로 사료된다.
CON, no O. japonica powder added; OJ 2%, added O. japonica powder at 2%; OJ 4%, added O. japonica powder at 4%; OJ 6%, added O. japonica powder at 6%; OJ 8%, added O. japonica powder at 8%.
와송 분말 첨가에 따른 증편의 조직감은 Table 5에 나타내었다. 조직감이란 사람이 식품을 섭취하는 작용을 모방한 물성 측정 방법으로 시료를 한 입 크기로 자른 후 두 번 압축을 가해 식품의 물성을 측정하는 방법이다(Kim 등, 2020). 경도(hardness)는 CON이 710.09 g으로 가장 낮게 측정되었고, 와송 분말 2%, 4%, 6%, 8% 첨가 시 각각 766.80, 828.84, 897.37, 1,055.17 g으로 분말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값이 증가하였다(p<0.001). 수분함량은 경도에 영향을 미치는데, Jeong 등(2014)의 비트 분말을 첨가한 증편 연구에서 부재료로 첨가되는 분말이 증편이 호화되는 과정에서 수분을 흡수하면서 경도를 증가시킨다고 보고하였다. 열매마 분말을 첨가한 증편 연구(Kim, 2022), 마끼베리 분말을 첨가한 증편 연구(Lee, 2020)에서도 분말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수분함량은 감소하고 경도가 증가하여 본 연구의 결과와 유사하였다. 따라서 와송 분말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수분함량이 감소함에 따라 경도가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부착성(adhesiveness)은 CON이 −1,046.04로 가장 낮았고, 와송 분말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1,098.95–-1,392.81로 값이 증가하였으며(p<0.001), Yang 등(2022)의 삼잎국화 증편 연구에서도 경도가 증가할수록 부착성도 증가해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탄력성(springness)은 식품에 외부로부터 힘을 가할 때 발생된 변형이 힘을 제거할 시 원상태로 회복하는 성질을 말하는데, CON이 0.36, 와송 분말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0.46-0.57로 값이 증가하였다(p<0.001). Kim(2022)의 열매마 분말 증편 연구에서 증편은 발효 과정에서 발생하는 CO2가 반죽의 팽창을 발생시키고, 증자 과정에서 형성되는 성분들의 변성에 의해 부드러운 망상구조가 형성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탄력성이 증가한 이유는 와송 분말을 첨가할수록 증편의 망상 구조 형성이 어려워져 경도가 증가하였기 때문에 탄력성도 동일하게 증가하였다고 생각된다. 응집성(cohesiveness)은 CON이 0.39, 와송 분말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0.38-0.37로 값이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진 않았지만, CON과 와송 분말 첨가 8%군은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p<0.05). Kang 등(2012)의 대두분말을 첨가한 떡볶이 떡 연구에서 부재료의 식이섬유와 당류가 응집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변성전분을 첨가한 증편 연구(Lee 등, 2012)에서는 재료 간에 결합력의 약화되면 증편의 응집성이 감소한다고 보고한 바가 있는데, 본 연구에서 사용된 와송 분말이 함유하고 있는 식이섬유와 분말 첨가량에 따른 결합력의 감소로 응집성이 감소된 것으로 사료된다. 검성(gumminess)은 CON이 274.50, 와송 분말 2%, 4%, 6%, 8% 첨가 군이 각각 297.77, 316.00, 337.51, 388.64로 와송 분말을 첨가할수록 값이 증가하였다(p<0.001). 검성은 경도와 관련이 있는데, 경도가 증가함에 따라 검성도 같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씹힘성(chewiness)은 CON이 99.17, 와송 분말 2%, 4%, 6%, 8% 첨가 군이 각각 135.57, 154.61, 177.59, 224.52로 증가하였다(p<0.001). 씹힘성이란 고체 식품을 섭취할 때 삼킬 정도로 씹는 데 필요한 힘을 뜻한다. 씹힘성은 경도, 탄력성과 같은 1차적인 특징과 관련이 있는데, Kim(2022)의 열매마 분말을 첨가한 증편 연구에서도 경도와 탄력성이 증가함에 따라 씹힘성이 증가하여 본 연구에서도 유사하게 측정되었다. 따라서 와송 분말을 첨가할수록 경도, 부착성, 탄력성, 검성 및 씹힘성은 증가하지만 응집성은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CON, no O. japonica powder added; OJ 2%, added O. japonica powder at 2%; OJ 4%, added O. japonica powder at 4%; OJ 6%, added O. japonica powder at 6%; OJ 8%, added O. japonica powder at 8%.
와송 분말 첨가에 따른 증편의 단면을 Fig. 3에 나타내었고, 기공의 수 및 크기는 Fig. 4와 Fig. 5에 나타내었다. 기공의 수는 CON이 100.33개로 가장 높게 측정되었고, 와송 분말 2%, 4%, 6%, 8% 첨가 군이 각각 75.33, 65.67, 48.33, 39.67개로 값이 감소하였다(p<0.001). 기공의 크기는 기공 수와 대조적으로 CON이 2.65 mm2로 가장 작았으며, 와송 분말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4.45-9.13 mm2로 크기가 증가하였다(p<0.01). 증편 제조 시 주재료로 사용되는 쌀가루는 밀가루가 함유한 글루텐이 없어 다공성의 조직을 형성하기 어렵지만, 증편은 발효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밀가루로 제조한 빵과 유사한 조직감을 가진다고 하였다(Park과 Jin, 2023). Choi 등(2013)의 다수성 및 가공용 쌀을 활용한 증편 연구에서 증편의 기공 분포 및 크기가 커지는 이유는 발효 과정에서 전분의 당화가 제대로 발생하지 않으면 CO2를 모두 포집하지 못해 구조가 붕괴되기 때문이라고 하였고, 증편의 부피 및 비체적이 클수록 기공의 수, 크기가 작고 고르게 분포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와송 분말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전분의 함량이 감소해 CO2를 포집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고, 이에 따라 부피 및 비체적도 분말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증편의 기공 수가 감소하고 크기는 증가한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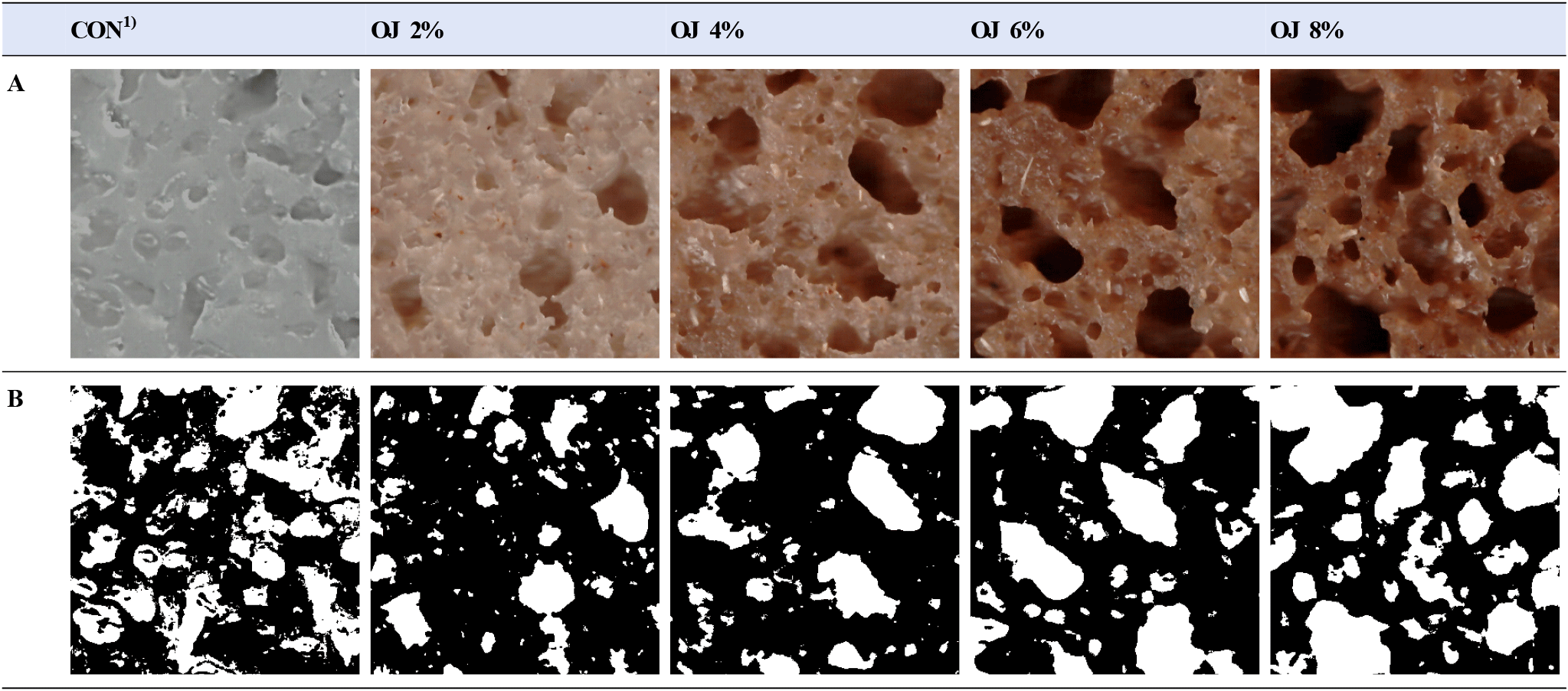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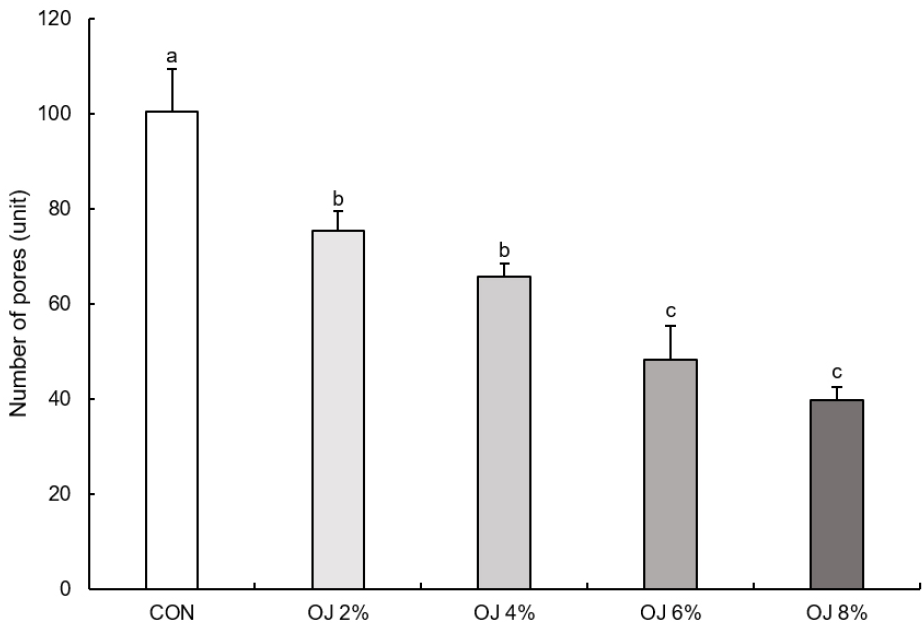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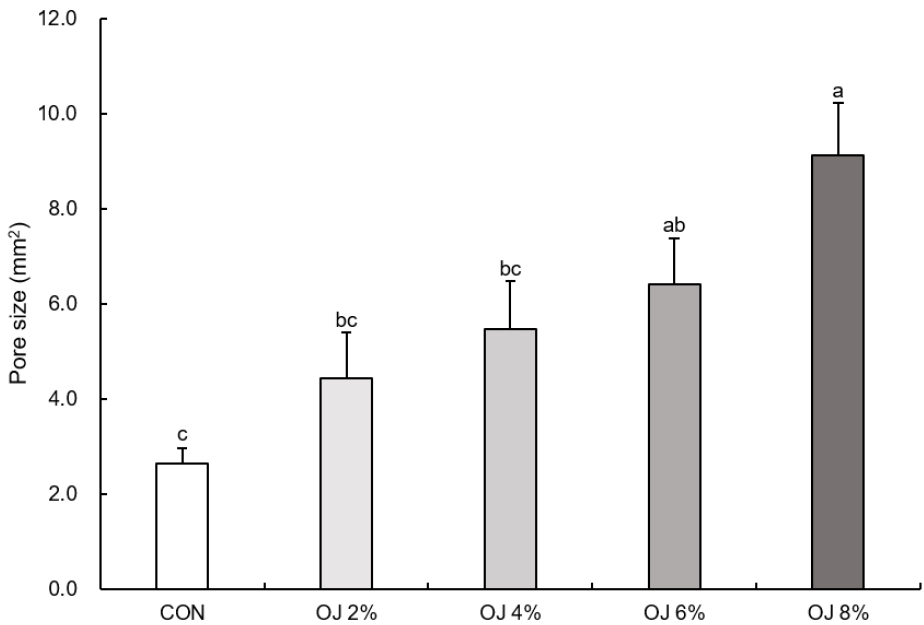
와송 분말 첨가에 따른 증편의 total polyphenol contents (TPC) 및 total flavonoid contents(TFC)는 Table 6에 나타내었다. TPC는 와송 분말을 첨가하지 않은 CON이 96.33 mg GAE/100 g으로 측정되었고, 와송 분말 첨가군은 126.33-546.33 mg GAE/100 g으로 분말의 첨가량이 많아질수록 값이 증가하였다(p<0.001). TFC에서도 CON이 42.15 mg QE/100 g으로 가장 낮았으며, 와송 분말 첨가군은 85.78-237.90 mg QE/100 g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p<0.001). Jung과 Choi(2016)의 와송 추출물 연구에서 와송은 phenolic acid과 같은 간단한 분자부터 tannin acid, gallic acid와 같은 고분자 화합물들을 포함하고 있어 항산화 작용에 탁월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Lee 등(2009)은 와송이 함유하고 있는 페놀 화합물의 항산화 작용이 수산기를 통한 수소 공여로 자유 라디칼과 쉽게 공명하여 안정화를 시킨다고 하였으며, 와송의 추출물별로 페놀 화합물을 측정한 결과 와송은 약용식물 중에서도 높은 값을 나타냈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 사용된 와송 분말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증편의 TPC 및 TFC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CON, no O. japonica powder added; OJ 2%, added O. japonica powder at 2%; OJ 4%, added O. japonica powder at 4%; OJ 6%, added O. japonica powder at 6%; OJ 8%, added O. japonica powder at 8%.
와송 분말 첨가에 따른 증편의 DPPH radical 소거 활성을 Fig. 6에 나타내었다. DPPH radical 소거 활성은 DPPH 시약의 자색이 항산화 물질과 반응하면 황색으로 변화하며, 황색이 짙어질수록 흡광도의 수치는 낮아지고 활성은 높아지는 반응이다(Ahn 등, 2015). 증편을 2.5 mg/mL 수준에서 분석한 결과, CON이 3.67%, 와송 분말 2%, 4%, 6%, 8% 첨가 시 각각 21.01, 41.21, 54.53, 69.21%로 분말의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활성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p<0.001). Hwang(2024)의 와송 분말 첨가 절편 연구에서 DPPH radical 소거 활성은 와송 분말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증가하였으며, 이는 와송과 같은 식물류의 생리활성성분이 DPPH radical 반응에 특징적이고, 와송 분말 함량에 따라 소거능이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와송 분말을 첨가할수록 DPPH radical 소거 활성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와송 본래가 함유하고 있는 고농도의 폴리페놀류로 인해 DPPH radical 소거 활성이 증가하였다고 사료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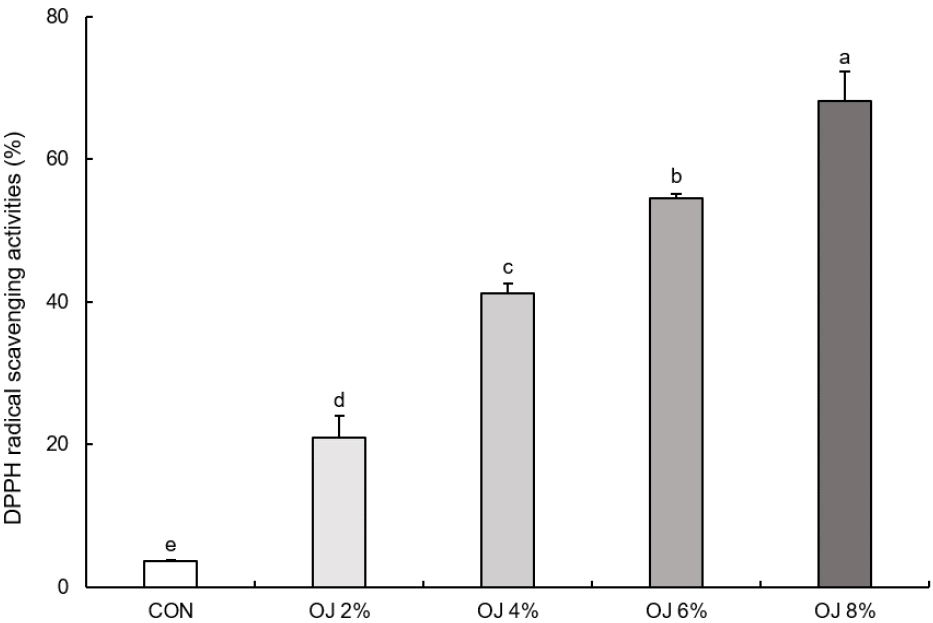
와송 분말 첨가에 따른 증편의 ABTS+ radical 소거 활성을 Fig. 7에 나타내었다. ABTS+는 2,2’-azino-bis(3-ethylbenzothiazoline-6-sulfonic acid)(ABTS)와 산화물질인 potassium persulfate와 반응하여 짙을 청록색을 띠는데, 이때 ABTS+ radical 소거 활성은 ABTS+의 청록색이 시료가 가진 항산화 능력에 의해 환원되어 투명색으로 변화하는 원리이다(Kim 등, 2024; Lee 등, 2011). 증편을 25 mg/mL로 분석한 결과, CON이 1.08%, 와송 분말 2%, 4%, 6%, 8% 첨가 시 각각 19.95, 38.87, 52.31, 75.01%로 분말 첨가에 따라 값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p<0.001). ABTS+ radical 소거 활성은 DPPH radical 소거 활성과 함께 항산화 능력의 평가 지표로 사용되지만, DPPH는 free radical을 환원시키고 ABTS+는 cation radical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차이가 존재한다고 하였다(Jin 등, 2016; Lee 등, 2014). Lee 등(2012b)의 와송과 한약재 복합물의 생리활성 연구에서 와송 추출물은 ABTS+ radical 소거 활성이 1,000 μL/mL 농도에서 70%의 활성을 나타내어 와송이 라디칼 소거 활성에 우수한 효과가 나타난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에서도 와송 분말 첨가량이 높아질 수록 ABTS+ radical 소거 활성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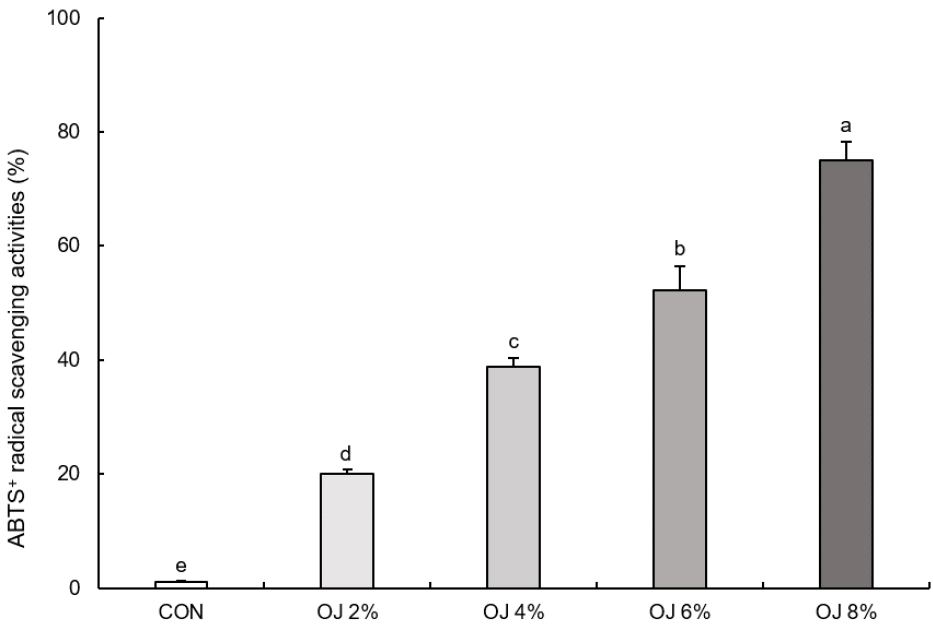
와송 분말을 첨가에 따른 증편의 환원력은 Fig. 8에 나타내었다. 환원력은 700 nm에서 Fe3+가 수소를 공여하고 자유 라디칼을 안정적으로 변화시켜 Fe2+로 환원되는 것을 흡광도로 나타낸 것이다(Sa 등, 2010). Choi 등(2007)은 폴리페놀류가 많을수록 Fe3+에서 Fe2+로 환원시키는 능력이 높다고 하였고, 이는 곡물에 존재하는 폴리페놀류가 수소 공여체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보고하였다. 증편을 0.1 g/mL에서 분석한 결과, CON이 0.07, 와송 분말 첨가 2%, 4%, 6%, 8% 첨가 시 각각 0.53, 0.94, 1.36, 1.86으로 측정되었다(p<0.001). 환원력은 방향족 화합물이 가지고 있는 hydroxy기의 치환 능력에 의존하고 있고, 폴리페놀류 화합물 함량과 높은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Kim 등, 2004). 본 연구에서 사용된 와송 분말은 다양한 방향족 폴리페놀류를 함유하고 있고, 총폴리페놀의 함량이 높기 때문에 분말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환원력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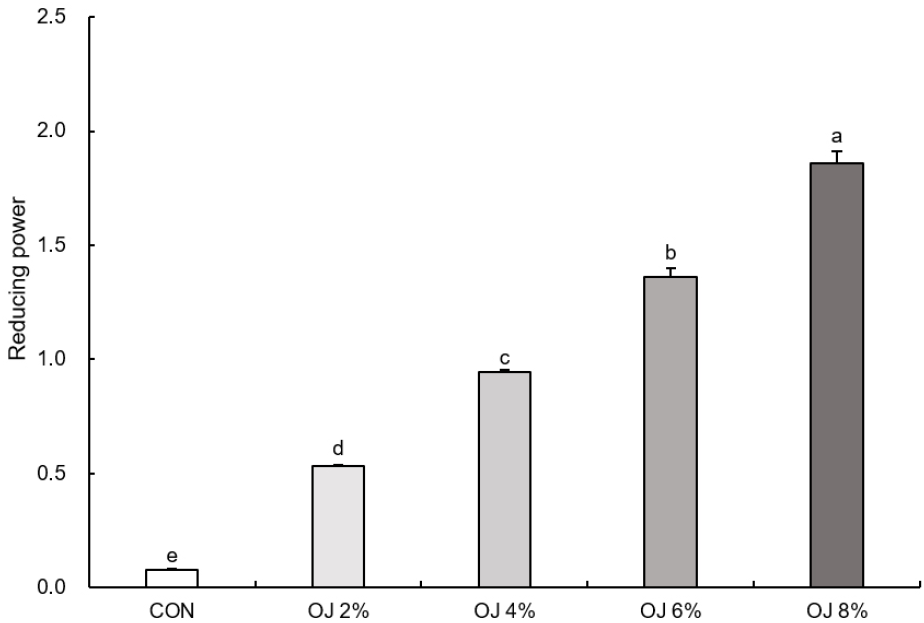
항산화 활성 상관관계에 대한 측정 결과를 Table 7에 나타내었다. TPC와 TFC가 ABTS+, DPPH radical 소거 활성, 환원력간의 항산화 활성에 대한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p<0.01 수준으로 분석하였다. TPC에 대한 TFC, ABTS+, DPPH radical 소거 활성 및 환원력의 상관관계는 r=0.982, 0.968, 0.961, 0.976으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TFC에 대한 ABTS+, DPPH radical 소거 활성 및 환원력간의 상관관계는 r=0.995, 0.990, 0.999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Kim 등(2024)의 와송 쌀머핀 연구에서도 TPC에 대한 TFC, ABTS+, DPPH radical 소거 활성 및 환원력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는데, 와송 분말을 첨가할수록 항산화 활성간의 상관관계가 양(+)의 값을 나타내어 본 연구와 유사한 관계를 보였다. 또한, Park 등(2007)의 블랙 라스베리 항산화 활성 연구에서 폴리페놀 화합물은 free radical에 수소를 직접적으로 공여해 항산화 활성이 높아지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와송의 폴리페놀 화합물 함량이 다량으로 존재해 항산화 활성 간의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와송은 항산화 활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증편을 제조할 때 첨가해 항산화 활성이 높은 기능성 식품으로서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Polyphenol | Flavonoid | ABTS+ | DPPH | Reducing power | |
|---|---|---|---|---|---|
| Polyphenol | 1 | ||||
| Flavonoid | 0.982**1)2) | 1 | |||
| ABTS+ | 0.968** | 0.995** | 1 | ||
| DPPH | 0.961** | 0.990** | 0.989** | 1 | |
| Reducing power | 0.976** | 0.999** | 0.994** | 0.988** | 1 |
와송 분말 첨가에 따른 증편의 기호도 및 특성 강도 평가 결과를 Table 8에 나타내었다. 기호도 평가 항목 중 외관 및 색은 와송 분말을 4% 첨가한 군이 가장 좋게 평가받았으며, 8% 군의 기호도는 가장 낮게 평가되었다(p<0.001). 향미는 와송 분말 첨가 4% 군이 다른 군들에 비해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8% 군은 가장 낮은 기호도를 나타내었다(p<0.001). Kim 등(2024)의 연구에서 와송이 함유하고 있는 특유의 향미가 기호도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에서도 와송의 향이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조직감 항목에서는 와송 분말을 첨가한 4% 군이 높은 기호도를 나타냈으며, 와송 분말 첨가 8% 군은 기호도가 감소하였다(p<0.001). 전반적인 기호도를 보았을 때 4% 군이 가장 높은 기호도로 측정되었고, 와송 분말을 가장 많이 첨가한 8% 군은 기호도가 가장 낮게 평가되었다(p<0.001). 본 연구에서 증편을 texture analyzer로 측정한 조직감 분석 결과, 조직감은 와송 분말을 첨가할수록 증가하였지만, 조직감이 과도하게 증가하면 전반적인 기호도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 사료된다.
CON, no O. japonica powder added; OJ 2%, added O. japonica powder at 2%; OJ 4%, added O. japonica powder at 4%; OJ 6%, added O. japonica powder at 6%; OJ 8%, added O. japonica powder at 8%.
증편의 특성 강도를 평가한 항목 중 단맛은 CON이 가장 강하다고 평가되었고, 와송 분말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약하다고 평가하였다(p<0.001). 와송을 첨가한 콤부차 연구(Jeon 등, 2022)에서 와송을 첨가할수록 당도가 감소하였으며, 이는 와송에 존재하는 당이 발효 과정에서 유기산의 형태를 띠며 감소한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발효 과정 중 유기산 생성에 의해 pH와 당 함량이 감소해 단맛의 강도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막걸리 향 항목은 CON이 가장 높았으며, 와송 분말을 첨가할수록 강도가 감소하였다(p<0.001). 와송의 향은 CON이 가장 낮게 측정되었고, 와송 분말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향의 강도가 증가하였다(p<0.001). 씹힘성 항목은 증편 섭취 시 삼킬 정도의 힘을 평가한 것으로, CON이 가장 약하고 와송 분말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강하다고 평가하였다(p<0.001). Kim 등(2022a)은 막걸리에서 나오는 이취와 맛이 기호도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에서 CON의 단맛이 가장 높았으나, 막걸리 향이 매우 강해 전반적인 기호도가 낮게 평가된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기호도 및 특성 강도 측정 결과를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증편 제조 시 와송 분말 4%를 첨가한다면 증편의 기호도 증가 및 기능성 식품으로서의 활용도를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4. 요약
본 연구는 쌀 가공 식품인 증편에 기능성 부재료인 와송을 첨가해 기능성 식품으로서의 활용도를 확인하기 위해 와송 분말을 멥쌀가루 대비 2%, 4%, 6%, 8%로 첨가한 증편을 제조하여 품질 특성, 항산화 활성을 분석하고 기호도를 평가하였다. 증편의 수분함량은 와송 분말을 첨가할수록 값이 감소하였다. pH는 와송 분말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값이 증가하였고, 발효 과정에서의 pH는 반죽 직후보다 모두 감소하였지만 증자 후에는 조금 증가하였다. 비체적과 팽창률은 와송 분말을 첨가할수록 모두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색도는 와송 분말 첨가군이 대조군에 비해 L값이 감소하였고, a값과 b값은 모두 증가하였다. 조직감에선 와송 분말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경도, 부착성, 탄력성, 검성, 씹힘성이 증가했고, 응집성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증편의 단면, 기공 수 및 크기를 측정한 결과, CON의 기공이 가장 세밀하고 많았으며, 와송 분말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기공의 수는 감소하였고 크기는 증가하였다. 증편의 총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와송 분말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높게 측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DPPH, ABTS+ radical 소거 활성과 환원력도 같이 증가해 와송을 기능성 소재로서 가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기호도 측정 결과 와송 분말을 4% 첨가한 군이 모든 군에서 높은 기호도를 나타내었다. 특성 강도 측정 결과에서 단맛과 막걸리 향 항목은 CON이 가장 강했고 와송 분말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강도가 약화되었다. 와송의 향과 씹힘성은 분말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강도가 강했다고 평가하였다. 본 연구의 내용을 종합해봤을 때, 증편 제조 시 기능성 부재료인 와송을 4% 첨가하는 것이 증편의 품질 개선과 항산화 활성이 우수한 식품으로써 활용될 수 있으며, 이는 쌀 가공 식품인 증편 개발에 기초자료로 사용되어 쌀 소비량 증가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